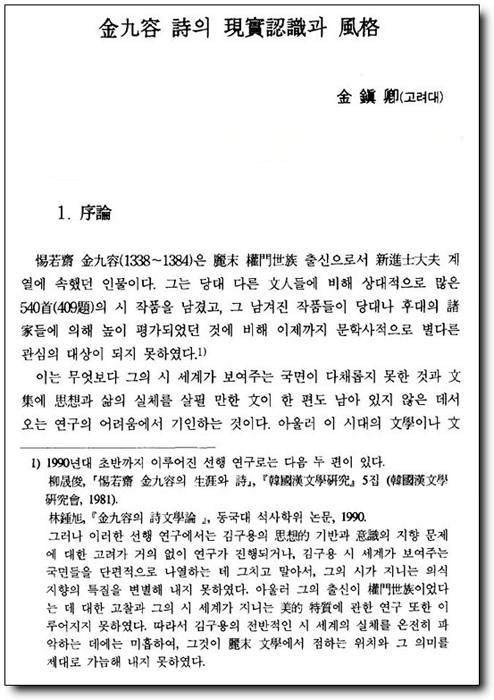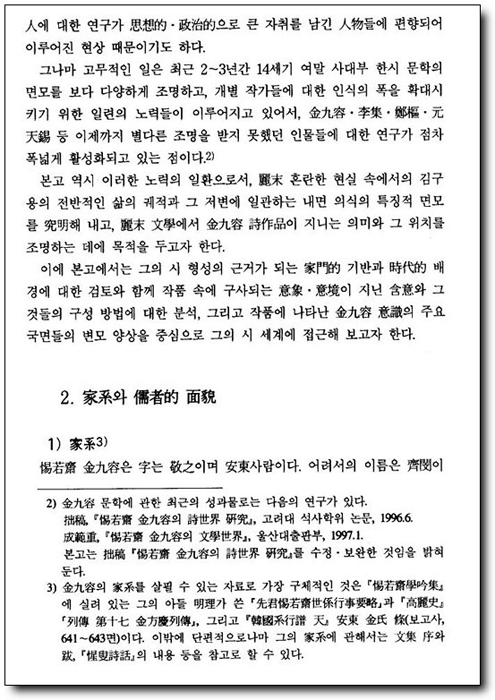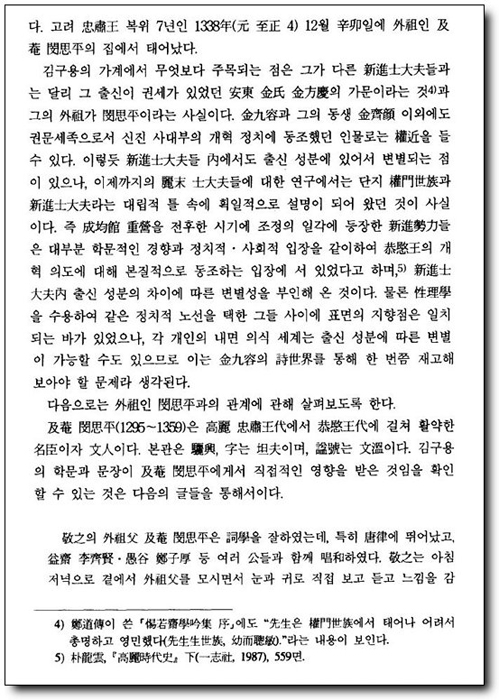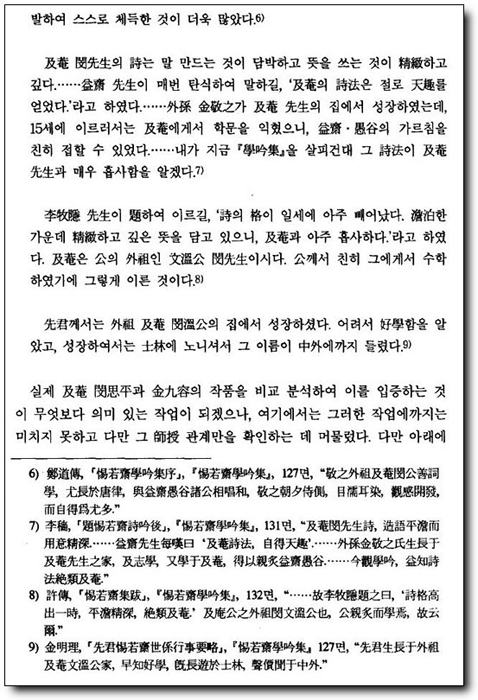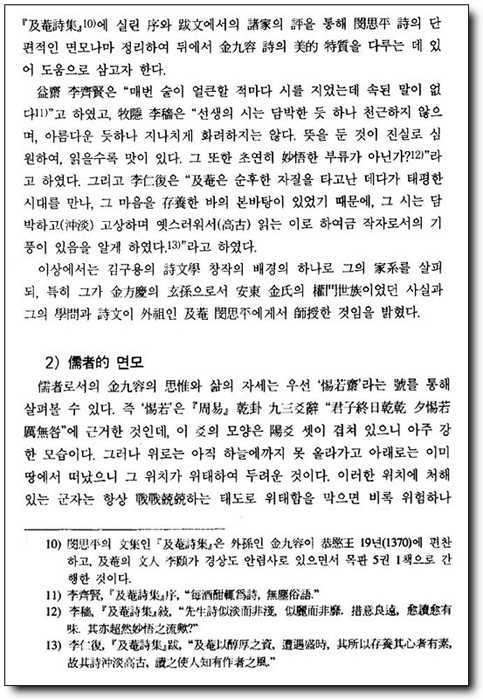본문
|
|
|
1) <安東客舍北樓次高祖上洛公詩韻 >(안동영호루에 고조 충렬공 시의 운을 따서) (2001. 영환(문) 제공)
先祖題詩字字淸 선조께서 지으신 시 글자마다 맑고 맑아, 重來此日更含情 오늘 다시 와서 보니 정감이 새로워라. 江山似有留連色 안동강산은 옛모습 그대로 어울러 있으니, 仍占春風末肯行 봄바람 기대서서 가기 싫을 뿐일세.
2) <동문선>내의 한시 소개 (2003. 6. 21. 태서(익) 제공)
(1)무창(武昌)
황학루 앞에는 강의 물결 솟구치는데 / 黃鶴樓前水湧波 강가에는 주렴과 장막 몇 천 집인가 / 沿江簾幕幾千家 돈을 추렴하여 술을 사서 회포를 푸노니 / 醵錢沽酒開懷抱 대별산은 푸른데 해는 이미 기울었네 / 大別山靑日已斜
(2)야박 양자강(夜泊揚子江)
달은 긴 강에 가득하고 가을 밤은 맑은데 / 月滿長江秋夜淸 배를 남쪽 언덕에 매고 조수 나기 기다렸다 / 繫船南岸待潮生 봉창에 잠이 깨어 어디인지 알겠거니 / 蓬窓睡覺知何處 오색 구름 깊은 곳이 제성이구나 / 五色雲深是帝城
(3)야장(夜莊)
문을 닫고 마침내 용렬한 사람들과 대하지 않고 / 閉門終不接庸流 다만 푸른 산만이 내 다락에 들어옴을 허락한다 / 只許靑山入我樓 즐거우면 시를 읊고 졸리면 잠을 자나니 / 樂便???便睡 다시는 내 마음에 다른 일 오는 것 없네 / 更無餘事到心頭
(4)송 곽구주 검교(送郭九疇檢校)
만리 천왕이 땅에 / 萬里天王地 어느 해 싸움의 티끌이 그치려는고 / 何年息戰塵 장군은 바야흐로 도끼를 받는데 / 元戎方授鉞 사신은 멀리 이웃 나라를 사귀러 왔네 / 信使遠交隣 발섭해서 창해로 왔다가 / 跋涉來蒼海 달리고 달리어 임금에게로 돌아가네 / 驅馳向紫宸 이제부터 서로 눈을 닦고 / 自今爭刮目 거듭 지원 봄을 보게 하세 / 重見至元春
(5)기해년 홍적(己亥年紅賊)
강개하여 호탕하게 담소하니 / 慷慨豪談笑 그윽한 서재에 맑은 밤이 깊어가네 / 幽齋淸夜深 슬픈 바람은 썩은 나무에 울고 / 悲風嘶朽木 괴로운 달을 성긴 수풀에 오르네 / 苦月上疏林 칼을 만지며 세 번 길게 탄식하고 / 撫劍三長嘆 술잔을 멈추며 한 번 크게 읊어보네 / 停杯一浩吟 압강에 도적들이 가득 찼으니 / 鴨江豺虎滿 건아의 마음이 어떠한고 / 何似健兒心
(6)정당시승을 충주 임소로 보내며[送鄭當寺丞之任忠州]
봄바람이 바야흐로 화창한데 / 春風方?蕩 절주(D-001)을 가지고 충주로 부임하네 / 持節赴忠州 꽃다운 풀 동문길이요 / 芳草東門路 수양버들 늘어진 옛 나루터일네 / 垂楊古渡頭 거문고를 타려주(D-002) 각을 열고 / 彈琴開古閣 홀을 비스듬히 잡고 높은 다락에 오르리 / 柱笏上高樓 응당 여강을 지나갈 터이니 / 應過驪江去 강가에 낚싯배를 매게 / 江邊繫釣舟
[주 D-001] 절 : 지방에 안렴사(按廉使)를 내 보낼 때는 임금이 절(節)을 준다. [주 D-002] 거문고를 타려 : 공자의 제자 자천(子賤)이 선보(單父)에 재(宰 : 守令)가 되어 한가로이 거문고를 타면서 백성을 잘 다스렸다.
(7)둔촌(遁村)이 시 여러 편을 부쳤기에 차운하여 적어 드림[遁村寄詩累篇次韻錄呈]
인생 백 년을 봄날의 꿈으로 여겼더니 / 百年春夢倚南柯 서늘바람 불어오니 가는 세월 느껴웁구나 / 一陣新?感歲華 때를 맞춰 풍월은 늘 벗이 되어주고 / 風月有期張作伴 흥 곧 나면 천지가 곧 내 집일세 / 乾坤乘興卽爲家 이후는 곳간 속의 쥐를 못 깨달았고주(D-001) / 李侯不悟倉中鼠 두부는 잔 밑의 뱀까지 의심했네주(D-002) / 杜簿猶疑盞底蛇 이제부터 함께 정작 은자가 되세나 / 從此共成眞隱遁 허예를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 莫將虛譽向人誇
[주 D-001] 이후는 곳간 속의 쥐를 못 깨달았고 : 이사(李斯)는 초(楚) 나라 사람인데 일찍이 고향에서 소리(小吏)로 있다가 칙간[厠]에 들어가서 똥을 먹는 쥐를 보고는 탄식하기를, “이 쥐가 이 더러운 데 있지 않고 나라의 쌀창고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편하고 배부를 것인가. 사람도 이와 같다.” 하고는 곧 진(秦) 나라에 들어가서 승상(丞相)이 되어 부귀를 누리다가 필경에 혹독한 형벌을 받아 죽었다. 여기서는 부귀가 화(禍)가 될 줄 깨닫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주 D-002] 두부는 잔 밑의 뱀까지 의심했네 : 응침(應?)이 주부(主簿) 두선(杜宣)을 술자리에 초청했는데, 두(杜)가 보니 술잔 속에 뱀이 있는지라, 마시지 못하고 돌아가 병이 났다. 뒤에 바로 그 자리에 술자리를 다시 베풀고 보니, 뱀은 활[弩] 그림자였으므로 두의 병이 나았다.
≪風俗通≫ 진(晋) 악광(樂廣)과 그의 친객 간에도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晋書 樂廣傳≫
(8)송 강릉 서렴사(送江陵徐廉使)
술 싣고 동교에 나오니 때는 늦가을 / 載酒東郊欲暮秋 국화 포기 옆에서 그대를 보내옵네 / 菊花叢畔送君游 외마디 울음으로 기러기는 하늘 밖을 건너는데 / 一聲雁度靑天外 천 리 길에 사람은 푸른 바닷가로 돌아가누나 / 千里人歸碧海? 백발 어머님은 일찍 짜던 베를 끊으셨지주(D-001) / 鶴髮慈親曾斷織 수의 사자가 방금 수레를 멈추었네 / ?衣使者正停? 여러 고을 수령들 다투어 이바지하니 / 遙知州郡爭奔走 헌수당 즐거운 잔칠 멀리 보는 듯하여라 / 獻壽堂前喜氣浮
[주 D-001] 백발 어머님은 일찍 짜던 베를 끊으셨지 : 맹자가 젊어서 배우다가 중도에 돌아오니 그의 어머니가 칼로 짜던 베를 끊으며 말하기를, “네가 학업을 폐함은 내가 이 베를 끊음과 같으니라.” 하니, 맹자가 두려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공부했다. ≪列女傳≫
출전;동문선
(9) 秋興亭詩(추흥정시) 시소개 (2005. 3. 안사연 종합 해석문. 항용(제) 제공) 龍山秋色淡人心 / 용산의 가을빛에 사람마음 맑아지고, 雲淨江澄草樹深 / 맑은 구름, 깨끗한 강물에 초목은 무성하네 竟日高亭誰是伴 / 하루종일 높은 정자에서 누구와 벗하리 一雙野鶴一張琴 / 오직 한 쌍 학과 한 벌 거문고뿐이리.
3) <축은집> 속의 문온공 시 소개 (2005. 7. 18. 영환(문) 발견, 2005. 8. 1. 익수(제) 번역. 항용(제) 제공) *축은집 : 축은 김방려(1324-1423) 문집 *축은 김방려( 1324-1423) 소개 : 김방려의 자는 汝用, 호는 築隱, 김해인이다. 권양촌 근이 일찍이 공을 김해로 돌아가도록 보냈다. 강직하였고 세상을 꺼림이 많았다. 스스로 학문을 닦고 문장력을 갖추고 있었다.
(출전 : 전녹생의 <야은일고> 존모록 기록내용-金方礪字汝用。號築隱。金海人。權陽村近嘗送公歸金海。有剛直多違世。懷藏自識時之句)
(1) 晩春贈築隱(만춘 증축은) 金若齋 (늦은 봄날 축은에게 주는 시--김구용)
暮春花柳敭蜂歌(모춘화류양봉가) : 늦봄 꽃과 버들엔 벌이 날아들고 先落後紅色色他(선락후홍색색타) : 떨어져 붉은 꽃들은 색색이 다르네 濕雨殘容多寂寞(습우잔용다적막) : 비에 젖은 모습 더욱 쓸쓸하고 飛風老態向如何(비풍노태항여하) : 날리는 바람에 시든 꽃은 어찌 될까 疎影依簾斜日滿(소영의렴사일만) : 주렴 사이로 드문드문 지는 햇빛은 가득하고 微香入鼎細煙和(미향입정세연화) : 은은한 향기는 엷은 향로 연기에 섞여 향기롭네 近來春事歸何處(근래춘사귀하처) : 요즘 봄의 일은 어찌되려나 杜宇啼聲碧峀過(두우제성벽수과) : 두견새 소리 푸른 산골에 메아리 치는데
* 축은 김방려 : 築隱 金方勵(1324∼1423) * 김구용(金九容) : 1338(충숙왕 복위 7)∼1384(우왕 10). * 여기서 바람처럼 날아가는 노인은 척약재보다 14세 위인 축은 김방려를 말함인 듯. * 敭=揚(오를양)의 古字. 疎=疏(트일, 성길 소)와 同字.
(2) 代 李穡 贈 築隱 (이색을 대신하여 축은에게 줌) 難醫身病百端兼(난의신병백단겸) : 백가지 병을 의원도 어쩌지 못하는가 右脇包根大不恬(우협포근대불염) : 오른쪽 겨드랑이에 뿌리가 더부룩하니 크게 불편해 土疾若非成長得(토질약비성장득) : 풍토병은 아닌 듯한데 점점 커지니 鱉症似是自我嫌(별증사시자아혐) : 별증과 비슷하여 내 스스로 싫어지네 形體相影丹枯木(형체상영단고목) : 몸을 비춰보니 붉게 시든 나무 같고 頭髮蕭條白露蒹(두발소조백로겸) : 머리털은 듬성듬성 흰이슬 맺힌 갈대와 같네 旅食江南渠父子(여식강남거부자) : 강남에서 나그네살이 하는 저 父子 藥餌扶吾愧還添(약이부오괴환첨) : 나에게 약 달여 주니 더욱 부끄럽네
*恬=(편안할, 조용할)염. 包=쌀,꾸릴,더부룩하게 날)포. 鱉=(금계) 별. 鱉症=자라처럼 오므리는 병. 蕭=(맑은 대쑥) 소. 蒹=(갈대) 겸. 旅食=나그네 삶. 餌=(먹이) 이.
*이색(李穡) 1328(충숙왕 15)∼1396(태조5). 고려말의 문신·학자.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영숙(穎叔), 호는 목은(牧隱). 삼은(三隱)의 한 사람이다. 찬성사 곡(瑴)의 아들로 이제현(李齊賢)의 문인이다.
(3) 代 李行 贈 築隱 (이행을 대신하여 축은에게 줌) 盤出高門白玉聲(반출고문백옥성) : 높은 문 돌아 나오니 백옥소리 나는데 朝朝暮暮養生情(조조모모양생정) : 조석으로 삶을 부양하는 마음이여 老馬恒思心上草(노마항사심상초) : 늙은 말이 항상 풀주기만을 생각하듯 飢態困下意中城(기태곤하의중성) : 굶주리고 곤궁하니 도성을 그리네 蔥笛放歌桃野犢(총적방가도야독) : 파 피리로 노래 부르고 복숭아 꽃 핀 들판엔 송아지 한가로운데 黃金誇富柳梭鶯(황금과부류사앵) : 황금빛 자랑하는 버들엔 꾀꼬리 정답게 노네 空空詩腹小圭竇(공공시복고규새) : 가난한 집에서 마냥 수박한 시상에 젖어 坐臥無端日力爭 (좌와무단일력쟁) : 앉으나 누우나 매일 끝없이 애쓰고 씨름하네
*축은 김방려 築隱 金方勵 : 1324∼1423 *김구용(金九容) : 1338(충숙왕 복위 7)∼1384(우왕 10). 이행(李行) : 1352(공민왕 1)∼1432(세종 14)
*蔥=파 총. 犢=송아지 독. 梭=베틀북 사. 竇=구멍, 구멍 낼 두, ‘가난한 집’의 뜻 空空=순박한, 무식한, 無端=끝없이
(4) 贈 築隱 (축은에게 줌)
鬱鬱開懷何妙方 (울울개회하묘방) : 우울한 생각을 어찌 풀어야 하나 茅廬相對洛西陽 (모려상대락서양) : 서울 서남쪽에 마주한 초가집 川雲密密千重疊 (천운밀밀천중첩) : 시냇가엔 구름이 천겹으로 쌓여 있고 野草靑靑十里長 (야초청청십리장) : 들풀은 푸릇푸릇 십여리에 펼쳐 있네 避暑老人要不得 (피서로인요부득) : 더위를 피하지 못하는 노인 入門白日自容光 (입문백일자용광) : 문안에 비치는 햇빛을 온몸으로 받도다 停無楠樹籬無菊 (정무남수리무국) : 숙사엔 나무도 없고 울타리엔 국화도 없으니 顔色何如杜草堂 (안색하여두초당) : 안색은 마치 초당에 있던 두보와 같도다
* 楠=녹나무 남 停=宿舍, 여관. 杜草堂=두보의 초당
(5) 贈 築隱 (축은에게 줌)
五月倍忙收麥田(오월배망수맥전) : 5월 보리밭엔 수확일로 바쁘기만 한데 風風雨雨比何年(풍풍우우비하년) : 바람과 비는 어느 해와 비교하랴 崇朝憂患家滲漏(숭조우환가삼루) : 아침 끼니 걱정이 집안에 스며 있는데 亭午光輝野歛烟(정오광휘야렴연) : 한낮 햇빛은 밝고 들에는 수확 연기일레 夢裏長思鄕飮酒(몽리장사향음주) : 꿈속에서도 오랜 생각은 고향에서 술 마시며 閒中坐數洛行船(한중좌수락행선) : 한가하면 서울 가는 배에 자주 앉던 일이네 短笻乍倚門前路(단공사의문전로) : 길 앞문에 기대어 잠시 피리 불면 意緖淸明霽後天(의서청명제후천) : 마음은 깨끗하고 맑아 비 갠 하늘 같도다
*滲=(스밀, 샐, 흘러나올 삼). 筇=(笻, 대나무, 지팡이 공), 乍=(잠깐 사), 霽=(갤 재)
4) 삼봉집에 들어 있는 척약재 관련 시문 (2005. 3. 3. 영윤(문) 제공)
출전 : <삼봉집>
(1) 약재의 집에 거처하다[若齋旅寓] 나그네 한 사람이 남읍에 와서 / 有客來南邑 옛 성 옆에 살림을 붙였네그려 / 僑居傍古城 잔산이라 초가집도 조그마한데 / 殘山茅店小 종이 창 밝아라 사양 비치네 / 斜日紙窓明 잔에는 금빛 같은 노란 술인데 / 杯酌黃金? 소반엔 정히 찧은 흰 쌀밥일레 / 盤餐白粲精 이웃에서 좋은 생선 보내를 오니 / 嘉魚?舍惠 손 반기는 주인의 온정이로세 / 好客主人情
(2)차운하여 여흥으로 돌아가는 김비감 구용 을 전송하다[次韻送金秘監 九容 歸驪興]
손님 중에 광달한 사람이 있어 / 客有曠達者 가을바람 불어오자 호해로 가네 / 秋風湖海歸 떠나는 정자는 쓸쓸한 풀에 어울렸고 / 離亭寒草合 마을 숲엔 저녁 연기 희미하여라 / 村樹暝煙微 색동옷은 부모님에게 나아갈 게고 / 綵服庭?近 시골엔 고기와 벼 살쪘으리라 / 故鄕魚稻肥 멀리서 알고 말고 이 태수님과 / 遙知李太守 누에 올라 밝은 달구경 할 것을 / 樓月共淸輝
(3)원성에서 김약재와 함께 안렴사 하공 윤 ㆍ목사 설공 장수 을 보고 짓다 [原城同金若齋見按廉使河公 崙 牧使?公 長壽 賦之 丁巳 ] *원성(原城)은 지금의 원주임
이별한 지 삼 년이라 이제 만나니 / 別離三載始相逢 지난 일 유유하다 꿈속과 같네 / 往事悠悠似夢中 훼예 시비 쌓인 속에 몸은 아직 살아 있고 / 毁譽是非身尙在 비환 출처 다르건만 도는 도로 같다네 / 悲歡出處道還同
* 공이 이때 원성(原城)회진(會津) 적소에서 돌아왔음. 후인의 평에 ‘이 두 글귀는 사의(詞意)가 융혼(融渾)하여 십을수록 남은 맛이 있음과 동시에 옛 소인(騷人)들이 천적(遷謫) 중에 쓴 산고(酸苦)한 상언(常言)을 씻어 버렸다.’ 하였음.
풍진이 쉬질 않아 서생은 병들었고 / 風塵未息書生病 세월이 물 흐르듯 지사는 궁할 밖에 / 歲月如流志士窮 어찌 차마 술상머리 이 가락을 노래하리 / 忍向尊前歌此曲 내일 아침 서로 갈려 서로 또 동으로 / 明朝分手又西東
*갑진 : 고려(高麗) 공민왕 13년(1364).
5) 각종 시문 종합
(1)척약재와 정포은의 시 (2002. 7. 14. 태영(군) 제공) 潤州甘露寺多景樓 次韻 (윤주감로사다경루 차운) / 윤주의 감로사 다경루에서 차운하다 江流漠漠鳥飛還 (강류막막조비환) / 강물은 아득히 흐르고 새는 날아 들어오는데 天近雲霞手可攀 (천근운하수가반) / 하늘은 놀에 가까워 손으로 당길수 있을듯 하네 始信此樓無價處 (시신차루무가처) / 이누각이 값을 헤아릴수 없는 곳임을 비로소 믿겠으니 望中相作畵圖看 (망중상작화도간) / 바라봄에 그림을 보는듯 하네
1372년(공민왕21)8월에 김구용(金九容)이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갔을때그보다 먼저 (공민왕21)5월에 서장관으로 와서 머무르고 있던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를 만나 함께 관광을 하면서 다경루에 올라 지은 시이다. 감로사 다경루는 강소성(江蘇省) 북고산(北固山)에 있으며 강산제일정(江山第一亭)이라 하여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한다.
(2)둔촌과 척약재 시 (2002. 7. 19. 태영(군) 제공)
寄敬之 (기경지) / 경지(김구용)에게 부치다
江樓高處是君居 (강루고처시군거) / 강루(江樓)의 높다란 곳이 그대의 거처인데 隔岸相望十里餘 (격안상망십리여) / 언덕을 사이하고 마주보니 십리남짓 하구려 一棹往來應數數 (일도왕래응수삭) / 노를 저어 오고감이 빈번해야 할터이니 此間吾亦結芽廬 (차간오역결아려) / 이쯤에다 나도역시 초가한칸 지으려네
附次韻 척若齋金九容 (부차운 척약재 김구용) / 척약재 김구용의 차운
曾約黃驪共卜居 (증약황여공복거) / 황여(黃驪)에 함께살자 일찍이 언약 했건만 奔馳南北十年餘 (분치남북십년여) / 남북(南北)으로 쏘다니기 십년이 넘었구려 如今始遂平生志 (여금시송평생지) / 이제는 아마 평생의 뜻을 이뤘을거라 여겼더니 猶自江邊未構廬 (유자강변미구려) / 아직도 강가에다 집한채 못지었단 말인가
*황여(黃驪): 여주의 고호(驪州古號)
*둔촌(遁村) 이집(李集) (1314 ~1388 / 충숙1 ~ 우왕14) 둔촌 유고집에서 옮겼습니다. 서울의 둔촌동이 옛날 행정구역으로 황여에 속했나요? 여주와 둔촌동은 먼 것 같은데... 이집선생의 호를 따서 둔촌동이라 명명하였다함.
(3)둔촌과 척약재의 시 (2002. 7. 19. 영환(문) 제공) 둔촌과 척약재의 시는 목은(이색)께서 지으신 시의 운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세분의 시를 함께 음미하면 더욱 감명깊습니다.
道美寺奇敬之 牧隱 李穡 도미사에서 경지에게
六友堂中君者居 (육우당중군자거)/ 육우당은 군자가 사시는곳 滿天淸興更無餘 (만천청흥갱무여 )/ 맑은흥취 하늘가득 남음이 없고 滂江佳處多苛絶 ( 방강가처다가절)/ 여강 가는곳 마다 절경 아닌곳 없으니 慾乞殘生對結盧 (욕걸잔생대결로)/ 남은여생 그대 옆에 집짓고 살고싶네
寄敬之 (기경지) / 경지(김구용)에게 부치다
江樓高處是君居 (강루고처시군거) / 강루(江樓)의 높다란 곳이 그대의 거처인데 隔岸相望十里餘 (격안상망십리여) / 언덕을 사이하고 마주보니 십리남짓 하구려 一棹往來應數數 (일도왕래응수삭) / 노를 저어 오고감이 빈번해야 할터이니 此間吾亦結芽廬 (차간오역결아려) / 이쯤에다 나도역시 초가한칸 지으려네
附次韻 척若齋金九容 (부차운 척약재 김구용) / 척약재 김구용의 차운
曾約黃驪共卜居 (증약황여공복거) / 황여(黃驪)에 함께살자 일찍이 언약 했건만 奔馳南北十年餘 (분치남북십년여) / 남북(南北)으로 쏘다니기 십년이 넘었구려 如今始遂平生志 (여금시송평생지) / 이제는 아마 평생의 뜻을 이뤘을거라 여겼더니 猶自江邊未構廬 (유자강변미구려) / 아직도 강가에다 집한채 못지었단 말인가
*六友堂: 척약재께서 여주천녕현에 사시던 당호, 처음에는 사우당이라 칭하였으나 다시 육우당이라 고쳤음. 六友는 江山雪月風花임 목은 이색이 지은 육우당기와 원재 정추의 육우당부가 있음
*육우당이 있던 곳은 옛날 여주 천녕현이라고 되어 있어 그 자리를 알아내려고 수 없이 찾아보았지만 확실한 곳은 찾지 못하고 다만 이포대교 근처라는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둔촌동은 아마도 이집선생께서 사시던 곳이었고, 사시는 곳의 이름을 따서 호를 지으신 듯합니다. 둔촌선생도 천녕현에 정자를 갖고 계셨던 듯 싶습니다. 근래에 광주이씨 종중에서 이포대교 근처에 다시 세웠습니다. 이름은 봉서루입니다. 물론 당시의 현장은 아니고요 추정하여 근처에 적당한 자리를 매수하여 세웠습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육우당을 재건해야 할텐데.. 매우 아쉽습니다.
(4)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의 척약재(惕若齋) 김구용(金九容) 시평(詩評)> (2003. 9. 17. 윤만 제공) ▣ 척약재(惕若齋) 김구용(金九容)의 시평(詩評) ▣
--척약재(惕若齋) 김구용(金九容)의 시는 매우 청신하고 섬부하였으니, 목은(牧隱)이,
"경지(敬之 김구용의 자)가 붓을 내려 쓰면 마치 운연(雲煙)과 같다." 고 칭찬한 것이 바로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일찍이 회례사(回禮使)가 되어 폐백을 요동(遼東)에 바치니, 도사(都司) 반규(潘奎)가 경사(京師)에 잡아보냈다. 그 자문(咨文)에 '말 50필'이라 할 것을 '5천 필'이라 잘못 적었기 때문이다. 명(明)의 고황제(高皇帝)는 우리나라가 요동백(遼東伯)과 사교(私交)한 것에 대해 성을 내고 또 말하기를,
"말 5천 필이 오면 풀어서 돌아가게 해 주겠다." 고 했다.
--이때 이 광평(李廣平 광평부원군 이인임(李仁任)을 말함)이 국정(國政)을 맡고 있었는데 평소에 공의 무리들과 사이가 나빠 끝내 말을 바치지 않았으므로 황제가 공을 대리(大理)에 유배시키니, 공이 시를 지어 이르기를,
사생(死生)은 명(命)이라 하늘 뜻을 어이하리/死生由命奈何天 동으로 부상(扶桑) 바라보니 고향 길은 아득한데/東望扶桑路渺然 양마(良馬)라 오천 필이 어느 제나 닿을는지/良馬五千何日到 도화(桃花) 핀 문 밖에는 풀만 수북 우거졌네/桃花門外草芊芊 라 하였고,
또 무창(武昌)에서 지은 시에서,
황학루(黃鶴樓) 앞에는 물결 솟구치는데/黃鶴樓前水湧波 강따라 발 드리운 주막은 몇천 챈고/沿江簾幕幾千家 추렴한 돈 술을 사와 회포를 푸노라니/醵錢沽酒開懷抱 대별산(大別山) 푸르른데 해는 이미 기울었네/大別山靑日已斜 라 했는데, 공은 마침내 유배지에서 죽고 말았다.
--그뒤 참의(參議) 조서(曺庶)가 또한 금치(金齒)에 유배당한 수년 만에 석방되어 돌아왔는데, 황주(黃州)에서 지은 시에,
물빛과 산 기운은 맑은 모래 어루고/水光山氣弄晴沙 버들 푸른 긴 뚝에는 천만 채 집이로세/楊柳長堤十萬家 무수한 상선(商船)은 성 아래 대고/無數商船城下泊 죽루(竹樓)의 연월(煙月)에는 젓대 노래 드높네/竹樓煙月咽笙歌 라고 하였다.
--나는 장부의 몸으로 좁은 땅에 태어나 천하를 유람하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겨 왔었는데 두 공(公)은 비록 이방(異方)에 유배되었으나 그래도 오ㆍ초(吳楚)의 산천을 다 보았으니 참으로 인간의 쾌사라 할 수 있겠다.
《출전 : 성소부부고 제25권 설부 4 說部四 성수시화(惺叟詩話)》
* 의견 : ▣ 솔내영환 - 이 글중 자문에 말50필을 오천필이라 잘못 적어...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혀균이 무엇인가 오해로 쓴 듯 합니다. 자문을 쓰는 사람이 어찌 오십과 오천을 잘 못쓸 수 있겠으며, 혹 오십의 十자에 위를 삐쳐서 千으로 속였다는 속설도 있습니다만, 역시 믿을 것이 못되고, 정사 어느 곳에도 이런 기록이 없고, 또 허균은 행례사를 회례사라고 잘 못 쓴 것으로 보아 정확한 기록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6) 呈從叔惕若齋島配時韻 / 종숙 척약재 유배때 보낸 시 (2003. 10. 26. 태영(군) 제공)
학당(學堂) 休(휴)
大理島中叔是非 / 대리도에 계신 숙주(叔主)의 시비(是非) 때문에 浮雲山下姪冠衣 / 부운산 밑에있는 종질(從姪)은 의관(衣冠)이 잦습니다. 島山千里相思夜 / 도산천리(島山千里) 떨어져서 서로 사모(思慕)하는 밤에 自獨無言不掩扉 / 스스로 홀로 말없이 사립문을 못닫나이다.
학당(學堂) 김휴(金休) 고려충정왕2년 (1350) - ?-- 안동인, 자는 鍊父(연부), 정몽주 선생의 문하생.
父는 전서공 김성목이며 아들은 김익정이다.
(7)<꿈의 민화> 속에 인용된 척약재의 시 (2003. 12. 23. 윤만(문) 제공) <꿈 의 민 화> - 목 차 - 1. 한국 민화는 장인들의 꿈을 그린 그림이다 2. 꿈의 민화, 민화의 꿈 3. 세상은 꿈, 허깨비, 거품, 그림자 같다 4. 아름답고 따뜻한 민화의 꿈 5. 깨달은 꿈은 어린이들의 꿈처럼 꾸밈이 없다 6. 세상을 큰 꿈으로 산 사람들
민화에 담긴 장인들의 위대한 꿈을 더듬어 본다. 바랄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꿈처럼 아름답게 본 장인들의 큰 마음이 잘 나타난 꿈의 민화들. 아무런 꾸밈이나 과장없이, 솔직하게 쉽고 간단하게 마치 어린이들처럼 꿈을 그린 장인들의 깨달음을 꿈의 민화, 민화의 꿈에서 찾는다.
- (전 략) -
3. 세상은 꿈, 허깨비, 거품, 그림자 같다.
포천과 연천 지방의 흙은 50억 살쯤 먹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선 캄브리아 기> 때의 바위와 흙을, 100년을 산다 해도 36,000날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의 한평생과 비교하면 인생은 눈 깜박할 사이에 지었다 피는 아침 버섯만도 못하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은하수 별들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를 약 60억 광년으로 잡는다. 1초 동안에 지구를 7회 반 도는 빛의 속도로 일 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하니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도 60억 년이 걸리는, 정말 한계는 있으나 끝이 없는 우주이다. 우주의 크기를 우리 지구만한 크기로 줄인다면 지구는 축구공만한 크기에 지나지 않는다 한다.
천문학이나 지질학적으로 볼 때, 인생은 한국의 문화 발전과 무역 진흥을 못마땅하게 여겨 고려 사람들에게 글을 배우지 못하도록 하고 교역도 금하자고 엉뚱한 주장을 편 중국인 소식[소동파(蘇東坡)]의 말처럼 큰 바다의 한 톨의 조[속(粟)]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백운(白雲)은 이 세상 인연으로 된 것은 모두가 꿈이요, 허깨비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인데 이를 잘못 알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탄식했다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불어유진실(佛語唯眞實) 착회관자다(錯會觀者多)
그것은 73년의 인생 살이를 결산하는 부휴[부휴선수(浮休善修) 1543 ~ 1615]의 마지막 시에도 나타나 있다.
칠십삼년유환해(七十三年遊幻海) - 일흔 세해 허깨비 바다에 놀다. 금조탈각반초환(今朝脫殼返初還) - 이 아침 허물 벗고 온 곳으로 돌아간다. 확연공적원무물(廓然空寂元無物) - 확연히 공적(空寂) 아무 것도 아님을 깨달으니. 하유보리생사근(何有菩提生死根) - 어디에 지혜와 생사의 뿌리 있는가.
사람들이 한평생을 애써 사는 것이 잠깐의 꿈 사이임을 깨달은 [방오노생일몽간(方悟勞生一夢間)] 중 일연(一然)이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김흔공 딸을 짝사랑하던 중 조신(調信)의 사랑을 적은 까닭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주인공은 그처럼 그리워하며 낙산의 대비 앞에 나가 결합시켜 주기를 애타게 기원했으나 모든 것이 허사였다. 몇 년 뒤 딴 곳으로 그녀가 시집 간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 앞에서 해가 저물도록 울고, 그리움에 북받쳐 쓰러지고 말았다. 그 때 그녀가 문 안으로 웃으면서 들어와 말했다.
「저도 언제가 스님 옆 모습을 잠깐 뵙고 마음 속에 사랑하고 잊은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 명령으로 할 수 없이 남에게 출가했으나 이제 같이 살고자 왔습니다. 」조신은 너무 기뻐 같이 고향에 내려가 40년을 살고 애들 다섯을 낳았다. 그러나 워낙 가난해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구걸하기 10년, 큰 아들은 굶어죽고 하나는 개에 물리고 … 도저히 더 살 수 없게 되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내가 처음 님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젊었습니다. … 그러나 그 고운 얼굴은 풀 위의 이슬처럼 사라져 버렸고, 백년 가약도 버들 꽃이 바람에 불리어 날아가듯 하였습니다. … 우리가 함께 살다 죽느니 차라리 애들을 나누어 갖고 헤어집시다. 」조신은 그 말을 듣고 기뻐서 막 떠나려는데 깨어보니 꿈이었다. 남가의 한 바탕 꿈이었다[남가일몽(南柯一夢)]. 조신은 정토사(淨土寺)를 지었다면서 일연은 덧붙였다. 어찌 조신의 꿈만이 그렇다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세상 즐거움만 알고 기뻐하고 애쓰지만 이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 .
이러한 꿈, 꿈같은 한 세상을 한국의 장인들은 이미 수 천년 전부터 몸으로 알고 있었다. 인생은 우주의 티끌, 물거품만도 못한 꿈 속의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이미 신석기 시대로부터 오늘까지 한국 장인들이 쌓은 예술사(藝術史)는 꿈의 역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5천년 전 한국의 조상들이 지석묘(支石墓 - 《공간》1977년 5월호 p 51) 둘레에서 시를 짓고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하늘에 제사할 때 그들은 사람과 하늘과 우주에의 꿈과 사랑과 믿음을 고백했다. 지석묘는 하늘로 향한 인간의 꿈을 그린 건조 양식이었고, 고구려 무덤의 구조와 벽화는 모두 저승에의 꿈을 나타낸 노래였다. 고구려, 신라, 백제의 좋은 불상들, 신라시대 토기의 모양, 고려 자기의 색과 형태, 그리고 그림, 조선시대의 정통화, 건축, 그림, 수많은 조각품, 그리고 도자기, 가구와 같은 공예품은 물론, 옛날부터의 문학과 시, 춤, 연극, 음악 속에는 장인의 꿈과 한국 사람의 꿈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 꿈의 뜻과 내용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꿈의 양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한국 예술의 심층에 깔려 있는 꿈은 고려시대 김구용[金九容, 척약재선생집(惕若齋先生集)]이 노래했듯이
무사인간사아희(無事人間似我稀) - 나처럼 무사한 람 드물다. 화산낙수독래귀(花山洛水獨來歸) - 꽃 산 떨어지는 물을 홀로 즐긴다. 강두고사창개(江頭古寺窓開) - 강 머리 옛 절 선창(禪窓) 열린 곳 장주몽접비(莊周夢蝶飛) - 장자 꿈 나비 날은다.
처럼 덤덤한 프로이드(Freud)의 해몽같은 세계가 아니다. 더구나,「 꽃이 보이지 않는다./ 꽃이 향기롭다./ 향기가 만개한다./ 나는 거기 묘혈(墓穴)을 판다」는 소름 끼치는 꿈이 아니다. 허무주의적인 차갑고, 무섭고, 불쾌하고, 엉뚱하고, 정신병자 같은 꿈이 아니라 따뜻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꿈만이 있을 따름이었다.
- (후 략) -
<우리 민화 홈페이지 http://www.folkart.co.kr에서 퍼옴>
(8) <삼봉집>(정도전 저)에 있는 척약재 관련 시 (2004. 1. 2. 윤만(문) 제공)
▣ 삼봉으로 돌아올 적에 약재 김구용 가 전송하여 보현원까지 오다
[還三峯若齋 金九容 送至普賢院] ▣ (이 해 여름에 공이 삼봉의 옛집으로 돌아왔음)
말 맞대고 읊으면서 도성문 벗어나니 / 聯鞍共詠出都門 조시와 산림이 길 하나로 나눠지네 / 朝市山林一路分 다른 날 서로 생각 어디메냐 묻는다면 / 他日相思何處是 송산이라 가을 달 화산의 구름일세 / 松山秋月華山雲
《출전 : 삼봉집 제2권 칠언절구(七言絶句)》
(9) <포은집>(정몽주 저)에 있는 척약재 관련 시 (2003. 1. 3. 주회(안) 제공) ■ 포은집 (정몽주 著, 1980중판, 대양서적)
●楊子나루에서 北固山을 바라보며 金若齋를 애도하다.
선생의 호탕한 기개 남쪽 고을 떨쳤으니, 옛날 함께 다경루(多景樓)에 오르던 일 생각하네. 오늘 이곳 다시 노나 그대는 보이지 않아, 촉강(蜀江) 어느 곳에 외로운 혼 노니는지.
●咸州에 이르러 척若齋의 詩에 次韻하다.
낙엽이 빈분하니, 그대를 생각하나 보이지 않네. 원흉은 깊이 들어오니, 오만한 장수 군사 멀리 나누었네. 산채에 가 비 만나고, 성 누각은 솟아 구름 바라보네. 전쟁이 四해에 가득하니, 언제 문물 닦을손가.
●若齋
쓸쓸한 행장일랑 들판 늙은이 같지마는, 새로운 시 비단 같아 주머니에 가득하네. 한강물 나의 발을 씻을 만도 하거니와, 어느날 그대와 함께 돌아들 가오리까?
●正郞 金九容에게 부침
스스로 이사할 기약이 있었으니, 아이를 시켜서 문 고요히 소제하네. 분주한 시정(市井)은 아득히 멀고, 고요한 삶이라 산촌에 가까웠네.
하마터면 양웅의 집에 가까웁고, 아니면 유신의 동산으로 의심하네. 주인은 치우치게 나그네 좋아하니, 어찌 그 높은 집에 가지를 않으리오.
●敬之의 詩에 次韻함
나라 돕고 시절 고칠 재주는 이미 성겼으니, 어려서 배운 것이 쓸모없이 되었구나. 삼봉은 은자라 누가 능히 닮으리오. 평생을 변치 않고 첫 번 마음 그대로네.
(10)<도은집>(이숭인 저)에 있는 척약재 관련 글 (2003. 1. 3. 주회(안) 제공) ■ 도은집 (이숭인 著, 1980중판, 대양서적)
●사람을 燕에 보내면서 겸하여 仲賢에게 편지하다.
펄펄 나는 단혈새끼(丹穴雛단혈추) 앉는 곳이 보통 나무 아니요 날래고 날랜 형하손(熒河孫) 큰길을 달리기를 생각하네 오부(烏府)는 본래가 좋은 벼슬, 사나운 세상에 갈 길을 잃어 소매를 뿌리치고 북쪽으로 나아가니 초목에 가을바람 저물었구나 연산(燕山)은 제왕이 도읍한 자리, 아득하게 연기와 안개로 막혀 있네 가는 길이 참으로 멀고 또 머니, 가더라도 조심하여 말을 달리게 내 들으니 천자는 성인이라니 팔짱 끼고 다스릴 도구를 마련하고 승상(丞相)은 선비를 구하노라고 밥먹을 틈도 없이 애를 쓴다네 자네는 학술이 풍부하나니 만나지 못할까 무엇을 걱정하랴 한번 가서 보기만 한다면 흔연히 특별 대우 받으리라 중현(仲賢) 정말 기발한 선비, 나와도 서로간에 친분이 있네 상종하기 10년이 넘었는데도 재주와 명망이 독보라 하네 가고 다시는 오지 않으니 나로 하여금 길이도 생각만 하게 하네 나 혼자 그윽한 고독을 지키면서 세월 따라 농촌의 채전만 생각하네 만일에 날개가 돋힌다면 만리라도 붙어서 따라가리라
●仲賢郎中에게 祝賀하여 주다 (이름은 齊顔, 中書兵部郎中이 되었다.-本註)
풍속 다른 나라가 스스로 의리를 사모하니, 성대(盛代)의 조정에선 어진 이 구하노라 급급하네 공명을 어느 누구 중히 여기지 않으리오, 재주와 덕망을 홀로 겸비하였네
주금(晝錦)은 당상(堂上)에 빛났고, 성초(星,車+召)는 일변(日邊)에 내려왔네 남아는 모름지기 뇌락(磊落)해야 되는데, 부럽구나 자네가 먼저 시작하였네
●驪江樓에서 若齋를 하직하고 그 詩를 次韻하다
누각이 강언덕에 높이 솟아서, 올라 보니 세상의 속정이 멀어진다. 물결이 빛나니 아침 해가 떠오르고, 나무가 빽빽하니 여름 바람 서늘하다.
어릴 때에 물과 산을 즐겨하여서, 인(印) 끈 차는 영화를 뜬구름같이 보았네. 어찌하여 낚싯대를 잡은 손으로, 말 채찍질하며 서울로 가나.
●若齋에게 부치다
약재 김좌할(金左轄)의 높은 그 의리는 나의 스승이라. 노래자(老萊子)의 춤은 부모를 즐겁게 하는 날이요, 위장유(사람인변배고偉長孺)의 경서는 아들을 가르치는 때라.
가을 산에 약 캐러 멀리 갔고, 달빛 어리는 포구에 배오기 더디었네. 좋은 시대 숨은 사람을 구하니, 장차 임금이 뜰을 보게 되리라.
●若齋를 傳送하다
예성(禮成) 항구에 가을 물이 맑은데, 부상에 돋는 해는 사람 향해 밝았더라. 큰 배에 만 섬이나 싣고 강남 가니, 사신이 도리어 말을 타고 가는 듯
●金仲賢이 살던 곳을 지나가다
동산에는 봄이 가며 낙화가 날고, 사립문 닫았는데 푸른 이끼(蒼苔창태) 끼었구나. 시와 술로 지내 버린 10년이 꿈 같으며, 용산에 이 태양은 맑게도 지는구나.
●神孝寺 息師(식사)의 葡萄軒(포도헌)에 쓰는데 達可,敬之 諸公과 함께 짓다
식사하는 방이 참으로 맑고 깊어, 누각 밖 포도 시렁에 가을이 왔네. 쟁반 가득히 마유 쌓아 좋은 텐데, 하필이면 술을 빚어 양주(凉州)를 통할 건가.
<도은선생문집에 있는 척약재에게 주는 시 2수> (2007. 9. 19. 태영(군) 제공) 寄若齋二首 金九容 北望山川阻。南來日月多。窮通知有命。消息要無他。
草色牽詩興。風光八醉歌。何時成邂逅。握手共婆娑。 世情元薄薄。天意亦悠悠。去國憐吾遠。論詩覺子優。 未書方朔牘。謾倚仲宣樓。會有團圝日。仍煩報柳州。 (時柳君克恕作驪興守)
척약재에 드리는 두수
북녘을 바라봄에 山川은 막혔으나 남녘으로 내려오니 세월은 많아라 窮通은 운명이 있음을 알겠고 消息은 다른 일이 없기를 바라네 풀빛은 詩興을 이끌고 風光은 취한 노래 속에 들어오네 어느때 만나려나 이 세상에서 함께 손 잡고 사세나 세상 인정은 원래 각박한 것 天意는 또한 悠悠하네 서울을 떠날 때 내 먼데 감을 어여삐 여기고 詩를 논함에는 그대 뛰어남을 깨닫겠네 方朔의 편지를 아직 쓰지 않고 仲宣樓에 느근히 기대네 마침 단란하게 모이는 날엔 번거로이 柳고을 원님께 알리리 (이때 류광서가 呂興고을 원이 되었다)
註: 若齋 ...惕若齋 . 金九容의 號 출전: 국역도은선생문집
6) <각종 연구 논문> (2003. 10. 16. 윤만(문) 제공) (1) 척약재 金九容의 詩世界 硏究/金鎭卿 高麗大 大學院 1996 811.12 ㄱ885ㅊ 학위논문(석사) (2) 金九容의 詩文學論/임종욱 東國大 大學院 1988 811.12 ㅇ997ㄱ 학위논문(석사) (3) 고려조 한시의 품격 연구 / 하정승 저 다운샘 2002 811.91 ㅎ148ㄱ (4) 金九容 詩 淸淨 意象에 내포된 정신적 의미 /유호진 2002 韓國漢文學硏究 제30집(2002. 12) pp.187-219 韓國漢文學會 811.9 ㅎ155 (5) 高麗 金九容과 그 詩의 浪漫隱逸的 意識 考 /柳晟俊 2002 中國硏究 제29권 (2002. 6) pp.157-177 韓國外國語大學校外國學綜合硏究센터中國硏究所 952 ㅈ552ㅎ (6) 척若齋 金九容 詩의 品格硏究 /河政承 2000 漢文敎育硏究 15(2000.12) pp.267-292 韓國漢文敎育學會 411.1507 ㅎ157 (7) 척若齋 金九容 詩의 一考察 :驪興 流配期의 詩를 中心으로 /河政承 1999 漢文學報 제1집 (1999. 2) PP29-45 우리한문학회 811.9 ㅎ157 (8) 高麗末 成均館 重營과 敎官들의 政治的 立場 /陳錫宇 1999 論文集 : 20,1('99.12) pp.105-140 湖南大學校 041.1 ㅎ199 (9) 공민왕대 사대부 작가 연구 : 출처에 대한 고민과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김보경 1999 梨花語文論集 17('99.10) pp.221-249 梨花女子大學校梨花語文學會 411.04 ㅇ966 (10) 척약재 金九容의 雲南 流配詩 硏究 /成範重 1995 울산어문논집 10('95.12) pp.103-127 울산대학교국어국문학과 411 ㅇ388 (11) 金九容 詩의 現實認識과 風格/金鎭卿/韓國漢詩硏究/청주대도서관
7)척약재 관련 논문 소개 (2003. 12. 3. 윤만(문) 제공)
韓國漢文學會 --2002년 춘계학술발표회 ○ 일 시 : 2002년 4월 13일(토) ○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인문대 교수관 111호 ○ 주 최 : 韓國漢文學會
【학술발표회 일정】
■ 등록 및 접수(12:45 ~ 13:00) ■ 개회사회 : 김 성 룡(호서대) ■ 기획주제(13:00 ~ 16:15) - 발표 13:00 ~ 13:30 이 승 수(한양대) 「祭文형식의 미학적 가능성 : 變格祭文을 중심으로」 13:30 ~ 14:00 이 지 양(광운대) 「18세기 사대부의 祭亡室文」 14:00 ~ 14:30 이 은 영(이화여대) 「조선후기 御製 제문의 規範性과 抒情性 : 숙종·영조·정조의 제문을 중심으로」 - 휴식(14:30 ~ 14:45) - 종합토론(14:45 ~ 16:15) 좌장 : 김 시 업(성균관대) 김 남 기(서울대 규장각), 박 무 영(한림대), 김 미 란(수원대)
■ 자유주제(16:25 ~ 18:05) 발표 16:25 ~ 16:50 윤 재 환(단국대) 「고려조 宋詩風 수용의 의미」 16:50 ~ 17:15 유 호 진(고려대) 「金九容 시의 淸淨함에 내포된 정신적 의미에 대하여」 - 종합토론(17:15 ~ 18:05) 좌장 : 정 재 철(단국대) 김 승 룡(고려대), 김 보 경(이화여대)
■ 총회(18:05 ~ 18:30)
발표 요지 (1)金九容 시의 淸淨함에 내포된 정신적 의미에 대하여 호 진 (고려대) 1. 머리말
麗末의 대표적 시인으로 우리는 흔히 李穡․鄭夢周․李崇仁 등을 지목하지만 이들 시인에 못지 않는 시적 성취를 보인 시인으로 惕若齋 金九容을 들 수 있다. 문집을 발간할 당시 이미 많은 작품이 일실되어 현재 약 540여수 가량이 남아 있는 척약재의 시는 여러 先人들에 의해 그 높은 품격이 지적된 바 있다. 牧隱 李穡은 척약재의 시에 대하여 天趣를 얻은 閔思平의 詩와 대단히 닮아 붓을 대면 雲煙이 일어나는 듯하다고 언급하면서, 그의 시풍격을 平澹精深하다고 평하였다.1) 그의 벗인 鄭道傳 역시 그의 시에 대하여 ‘淸新雅麗’하다고 평가하면서 一家를 이룬 시인으로 찬양한 바 있다.2) 이밖에도 趙云仡이 그 淸贍한 풍격을 언급하면서 고려 시인 十二家의 한 사람으로 추숭하였고 허균은 그의 詩를 매우 淸贍한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3)
이러한 諸家의 평에서 주목되는 점은 척약재 시의 풍격을 대개가 ‘淸’이라는 미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고려말 시인들의 작품에 ‘淸’ 風格의 시가 흔히 나타나고 전체적인 작품세계가 淸의 미감을 지닌 것으로 일컬어지는 시인들도 있기는 하지만, 척약재처럼 여러 평자들이 거의 일치된 평가를 내린 것은 드문 경우가 아닌가 한다. ‘淸’의 풍격은 司空圖의 「二十四詩品」에 따르면 ‘雄渾’과 대조를 이루는 풍격으로 陰柔之美로 분류되며,4) 흔히 俗世의 더러움을 벗어난 작가의 순결한 정신을 표상하기에 적합한 미감으로 일컬어진다. 말하자면 淸의 풍격은 내면적인 성향을 지닌 작가의 정신이나 삶의 자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미감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면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의미이다. 여말에 척약재와 함께 淸의 미감을 지닌 작품을 산출한 시인으로 자주 거론되는 도은 이숭인은 그의 시에서 淸新한 詩語․意境을 통해 주로 순결한 자신의 생활이상을 표현했다. 이에 대해 특이할 정도로 淸淨의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는 척약재 시의 경우는 이러한 이미지가 시인의 현실인식과 더 긴밀하게 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그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청정한 이미지가 내포하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척약재의 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90년대 이후에 와서 이루어졌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주로 시인의 생애나 詩의 내용상의 여러 국면을 소개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그럼에도 그의 自然詩에 나타난 청정함에 대한 관심은 초기 연구에서부터 촉발되어 道家的 또는 禪家的 氣味를 담고 있음이 보고되기도 하였고5) 淸靜한 景物의 묘사에 유의하여 그의 자연시가 淸靜이라는 내면경계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6) 특히 후자의 논문에서는 척약재의 시에 구사된 의상들이 ‘차고 고요하며 맑고 밝은 느낌을 주는 미세한 것들’이라는 시적 특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유기적인 연관 하에 구체적인 의미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척약재 시의 연구에 있어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척약재 시의 이러한 특성과 이와 연계된 국면들에 유의하여 척약재 시의 전반적인 의미맥락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憂愁의 정조와 부정적 세계인식
이 장에서는 척약재 시에 나타난 일반적인 語調, 情調 등을 살펴 그의 성품과 기질 등을 탐색해보고 아울러 여기에 바탕을 둔 척약재의 世界認識의 면모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들이 淸淨한 의상이 출현하게 된 정신적인 배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척약재의 문집을 살펴보면 그의 삶을 빛나게 했던 과감한 행적들 - 예컨대 당대 집정자의 뜻을 거스르고 원나라 사신의 입국을 반대했다가 竹州에 유배된 사건이나 재출사기에 우왕에게 이색․정몽주의 政敵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던 일, 그리고 明에 사신으로 갔다가 외교문제로 유배되어 죽음을 맞게 되었음에도 이를 의연한 자세로 받아들였던 일7) 등으로 예견되는 기질과는 사뭇 거리가 있는 듯한 시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한 시들은 나직하고 섬세한 여성적인 어조로 그리움과 상실감을 노래한 작품들이다. 여말의 여타 시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또렷한 시적 성취를 거두고 있는 여성정감을 표출한 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卜算子」
倚戶望斜陽 문에 기대어 지는 햇빛 바라보니 正在孤村樹 바로 외딴 마을 나무 끝에 있어라 淚眼昏昏鳥遠飛 눈물 젖어 흐릿한 눈에 멀리 날아가는 새 京國知何處 서울은 어디에 있는가
一別似千秋 한 번 이별하자 천추 세월 같아 此恨憑誰語 이 한을 누구에게 말할까 極目千山又萬山 千山 또 萬山을 끝까지 바라보노니 底是郞歸路8) 어디가 낭군이 돌아오시는 길일까
“어디가 낭군이 돌아오시는 길일까”라는 마지막 句의 진술이 시사하듯이 이 詞는 여성화자가 이별의 情恨을 토로한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뛰어난 점은 님과 이별한 여인의 미묘한 심리를 자연 경물의 치밀한 안배를 통해 섬세하게 표현한 점이다. 작품 전반부에서 시인은 여인의 눈에 비친 외딴 마을 나뭇가지 끝에 걸린 지는 햇빛을 興의 수법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녀의 절박한 외로움과 깊은 상실감을 전달한다. 그리고 눈물어린 눈에 비치는 나는 새를 통하여 임을 향한 그녀의 그리움을 미묘하게 전해준다. 다음 구에 낭군이 있는 서울을 더듬어 찾고 있는 그녀의 시선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 전반부는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심정을 암시하고 있는 나뭇가지 사양빛으로부터 임을 향한 그리움을 암시하는 새로, 그리고 낭군이 있는 서울로 움직이는 구도를 통해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한다고 할 수 있다. 詞의 후반부는 임과 나와의 격절감을 드러낸 것이다. 천추의 세월이라는 시간적 단절감과 千山․萬山이라는 공간적 격절감이 교차하여 그녀의 고독과 슬픔은 짙게 드러난다. 특히 수 없는 산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곳에서 낭군이 돌아오는 길을 찾는 그녀의 시선에는 깊은 격절감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갸날픈 희망이 있다.
이 작품의 고독한 여성 형상 및 그녀의 미묘하고도 섬세한 내면심리의 묘사, 그리고 간절한 어조는 동시대 문인들의 여성정감을 드러낸 시와는 색다른 점이 있다. 동시대 문인들이 중국의 악부시를 차용하여 상투적이고 관습적인 표현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대하여 척약재는 자신의 억제하기 어려운 상실감을 참신하고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작품도 여성적인 어조 내지 정감이 나타난 작품이다.
「寄人」
花落鸎啼春去 꽃지고 꾀꼬리 우는 속에 봄은 가는데 倚樓無限相思 누각에 기댄 채 한없이 그리워하네 竹嶺嵯峨橫翠 죽령이 아스라이 푸른 빛으로 가로막아 섰지만 未遮淸夢東馳9) 동으로 달리는 맑은 꿈이야 막지 못하리
지는 봄의 광경을 단순하면서도 섬세하게 포착한 起句에서 작중화자는 봄이 가는 슬픔을 통해 가는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승구에서 누각에 기대어 있는 시름겨운 여성의 형상, 무한한 그리움을 지닌 화자의 내면이 드러나는 것은 이러한 의미맥락을 이은 것이다. 간절한 심정이 더욱 짙게 드러나는 것은 작품 후반부에 놓인 시적 형상화를 통해서이다. 아스라이 푸른 빛으로 높이 솟아 있는 죽령이라는 거대한 장애를 화자는 꿈을 통하여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깊은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여기에는 임과의 만남이 꿈에서 밖에는 실현될 수 없다는 상실감이 함축되어 있다.
이 시의 특징은 단순하면서도 기발한 착상 그리고 청신한 정조로 화자의 그리움을 호소한 점이다. 후반부의 묘사에 드러난 이러한 표현기법은 조선시대 여류시인의 작품을 연상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시인은 「長相思」 「畵堂春」, 「感薄命兒, 寄朴代言」, 「寄李丹陽」第三, 「秋日晩晴」 등 여러 작품에서 자신의 상실감과 그리움을 여성적 어조에 실어 노래했다.10) 척약재가 여성정감의 시를 다수 창작했던 것은 그의 삶의 자세나 정신적 기질과 무관하지 않는 듯하다. 대체로 여성적 어조의 시들은 세계의 횡포에 따른 고난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척약재가 세계의 폭압에 저항하기보다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내향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목은이 척약재의 그의 아우 齊顔의 삶의 방식을 비교한 다음 글에서도 그의 내향적인 성격을 읽을 수 있다.
형은 字가 敬之이고 아우는 字가 仲賢인데, 총명하여 빼어난 재주가 있음은 두 사람이 한결같았다. 그러나 아우는 신돈이 발호하는 날에 그 英銳한 기상을 누르지 못하고 드러내어 분연히 맨손으로 맹수를 갈기고 빈주먹으로 날카로운 칼날을 막으려다가 마침내 화를 입어 운명을 달리했다. 敬之는 조용히 들어앉아 외물을 거스르지 않았으며 깊이 유학의 가르침을 음미하여 綱目이 모두 ꡔ大學ꡕ 책 한권에 있다고 여겼으니 밤낮으로 되풀이 해서 읽고 자세하게 체득하여 일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한결같이 이 책에서 나왔다. 이른바 스스로 만족하는 자는 遺恨이 없는 경우이다.11)
척약재 시의 전체적인 어조는 부드럽고 나직하며 시에는 세계를 마주한 자아의 적극적인 행동에의 의지나 불의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현실의 문제를 다룬 시들은 그 지배적인 정서가 憂愁와 孤獨感이다.
「寄仲賢」 雨絶風淸意欲秋 비 그치고 바람은 맑아 가을 기운 일어나더니 夜深明月照書樓 밤 깊자 밝은 달이 서재를 비추누나 捲簾危坐發長嘯 발 걷고 단정히 앉아 긴 휘파람 불 적에 隔檻虫聲足貢愁12) 난간 너머 벌레 소리는 시름을 바치네
아우인 齊顔에게 부치는 이 작품은 자신의 憂愁를 경물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통하여 제시한 佳作이다. 우선 깊은 밤 밝은 달빛이 비쳐드는 누각의 묘사가 시인의 깊은 고독감을 암시하고 있다. 轉句에 드러난 시인의 형상은 이러한 의미맥락을 이은 것이다. 주렴을 걷는 행위가 그의 답답하고 울결된 심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면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긴 휘파람을 부는 시인의 모습은 깊은 고독 속에서 저절로 솟아올라 억제하기 어려운 그의 처연한 수심을 보여준다. 이를 이어 시인은 자신의 시름을 난간 너머의 벌레 소리로 형상화하여 깊은 여운을 전하고 있다.13)
이 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서늘하고 어두운 이미지에 맑고 고요한 의상이 결합하여 깊고 그윽한 의경이 형성된 점이다. 이 幽深한 의경이야말로 시인 자신의 바닥 모를 깊은 시름을 함축적으로 암시한다. 시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암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시적 효과를 더욱 높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척약재의 시에는 현실에 대한 憂愁를 담은 작품들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의 憂愁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다음 시는 직서를 통해 자신의 고민을 또렷하게 밝히면서도 시적 흥취를 잃지 않은 작품이다.
「漫成」 早歲孜孜慕古人 젊은날 옛사람 사모하여 부지런히 힘썼으니 欲將儒術致君民 儒術로 요순시절 이루려 함이었네 如今流落江村裏 이제 江村에서 곤궁하니 一任光陰老我身14) 이 내 몸 세월 따라 늙는 대로 맡겨두리
이 시가 직서이면서도 감흥을 일으키는 주된 이유는 앞 두 구와 뒷 두 구의 진술이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대조는 둘 사이에 놓인 時空間 차이에서 분명하게 감지된다. 젊은 시절의 그는 자유로운 삶의 공간 속에서 古人을 벗하며 살았지만 장년이 된 지금은 江村이라는 궁벽진 공간에서 남은 생애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시공간의 개방과 폐쇄는 바로 정신의 자 와 억압을 의미하는 것으로 둘 사이에 깊은 단절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대조는 시의 내용을 통해 명료해진다. 태평시대의 성취라는 심원한 이상의 실현을 위해 학문과 수양 그리고 이념의 실천에 전력을 다해온 젊은 시절은 사명감과 의욕이 충만한 시기였다. 그러나 江村이라는 좁은 공간에 流落하고 있는 지금은 곤궁과 고뇌 속에 체념만이 남아있는 시기이다. 결구의 서술은 심원한 이상에의 비전이 자신의 노쇠한 몸을 응시하는 시야로 축소되었음을 통해 자신의 깊은 상실감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흐르는 세월 속에 자신의 몸이 늙어가게 내버려둔다는 진술에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의 통제를 넘어서 버린 인생에 대한 회한과 자괴감이 놓여 있다.
「送族僧入山」에서 자신이 스님을 따라 자연 속에 살지 못함을 애석하게 여기면서도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은 모름지기 나를 용서하라, 임금과 백성을 요순시대처럼 만든 후에 비로소 자연에 귀의하리”15)라고 읊은 것도 유가적 이상사회의 실현이라는 시인의 삶의 목표를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 우수의 정조가 깊게 드리워진 것은 그 한 원인이 이 거대한 삶의 목표의 좌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竹州의 유배를 거쳐 6년 가량 여흥에 물러나 있을 적에도 출사에의 향념이 지속적으로 그의 시에 나타난 것이나 그가 일련의 작품 속에서 자신과 같은 이상을 품은 士類들이 정치적 탄압에 희생당하는 상황을 꽃과 비바람의 관계로 은유한 것16)도 그의 이러한 이상의 좌절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삶의 깊은 고뇌는 개인적인 삶의 현실 위에서도 파생하였다. 高祖인 金方慶이래로 계속 세족의 지위를 누려온데다 閔思平 집안 등 당대의 명문과 혼인관계를 맺어 더욱 번성했던 그의 가문은 당대에 勢가 많이 위축되어 척약재는 과거에 급제한 뒤에도 10년 가까이 한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17) 또 아우인 齊顔이 신돈을 죽이려고 모의하다 발각되어 처형된 것이 그의 나이 31세 때였다. 아우의 죽음은 그의 삶을 뒤흔들 정도의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남겼다. 동생의 죽음 이후 그가 이름을 齊閔에서 九容으로 고치고 齋號를 惕若으로 삼았던 일18)은 이러한 정황을 시사하는 단서이다. 君子가 修身處世하는데 지녀야 하는 아홉 가지 몸가짐을 뜻하는 ‘九容’과 德業을 부지런히 닦으며 근신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惕若’은 그의 삶의 위태로운 정황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시를 통해 살펴볼 때 그는 갖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얼크러져 나타난 이 세계를 근원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인 시각으로 통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漫成」
太眞大謬混埃塵 太眞이 크게 잘못되어 티끌 속에 섞이니 得喪興亡過眼頻 얻음과 잃음 흥함과 망함이 어지럽게 눈앞을 지나가네 富何更道周公富 부유함으로 어찌 또 周公의 부유함을 말할 것인가 貧又休論顔子貧 가난함으로 또한 안연의 가난도 논하지 말라 主敬行義乃君子 敬을 주로하여 義를 실천함이 바로 군자이며 餙詐釣名眞小人 거짓을 꾸며 명성을 낚는 것은 진실로 소인이라 月滿雪深山閣靜 달빛 가득하고 눈 깊이 쌓여 山閣은 고요한데 自春元只浩然春19) 새해 첫날부터는 다만 호연한 봄이리라
약재의 시가 일반적으로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지니고 있는데 비하여 이 작품은 단호하고 힘찬 어조가 주조를 이룸으로써 확고한 자신의 세계관 및 삶의 자세를 암시하고 있다. 聯과 聯 사이에 의미의 비약이 존재하는 만큼 이 시에서는 各句 사이에 놓인 의미상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얻음과 잃음 흥함과 망함이 어지럽게 눈앞을 지나간다’는 首聯의 진술은 혼란한 세계상을 상징한 것이다. 끝없이 변화하여 안정과 화평을 잃은 이러한 세계의 모습은 어디에서 초래된 것인가? 시인은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함련에서 제시한다.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일컬어지는 周公의 부유함이나 안연의 가난조차도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독특한 진술은 빈부귀천이라는 의미 없는 삶의 형식에 얽매여 살기를 거부하는 그의 의식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는 삶의 본질적인 의미나 가치를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진 세태에 대한 첨예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를 시인은 太眞의 상실로 진단한다. ‘太眞’은 우주가 생성될 때의 眞氣로 이해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眞’이라는 개념으로 세계의 본질을 이해했다는 사실이다. 이 세계가 본래의 참된 면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혼란과 쇠퇴를 겪고 있다고 여긴 것이다. 頸聯 對句에 보이는 거짓을 꾸며 명성을 낚는 것에 대한 비난도 바로 虛僞와 假飾에 대한 비판으로 그의 세계인식을 반영한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出句에서 군자의 자세로서 主敬行義를 내세운 것도 인간의 참다운 삶의 양식을 제시한 것이다. 시인이 눈이 깊이 쌓인 산각에서 호연한 봄의 시작을 상상하는 것에서 이 세계가 부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그 본질적인 참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척약재가 ‘眞’이란 개념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眞을 강조했던 흔적은 그의 시 곳곳에 나타나 있다. 가령 「送鄭廉使」에서는 “天下가 몇 번이나 이어지고 바뀌었던가, 이 백성이 바로 三代 때의 그 백성일세. 어지러운 가운데 차츰 浮薄해졌고, 소란한 가운데 참됨과 순박함을 잃었네.”20)라 하였고 遁村 李集에게 보낸 시에서는 “이로부터 참다운 은둔을 이루리니, 헛된 명예를 가지고 남에게 자랑하지 마세나.”21)라고 하여 참다운 삶을 강조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예술의 기묘함도 작가의 天眞함에서 나온다고 언급하였다.22) 요약해보면 척약재는 개인적 불행으로부터 사회․국가의 혼탁함에 이르는 이 세계의 혼란이 이 眞의 상실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의 시에 나타난 짙은 우수의 정조에는 이러한 세계인식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척약재의 시에서 憂愁의 정조만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시가 이 우수로부터 초탈하여 眞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의 의식을 보여주며 그의 시에서 이 참됨은 흔히 淸淨의 이미지를 통하여 형상화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3. 淸淨의 이미지에 내포된 明澄한 정신
척약재의 시집을 살펴보면 시에 감각적 형상이 매우 많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淸淨한 이미지에 대한 시인의 유별난 기호이다. 정신적 안정이 느껴지는 작품의 대다수가 학․달․매화․시냇물 등 자연물이나 사물의 청정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다음 작품은 척약재 시의 그러한 경향을 또렷이 보여준다.
「釋房寓宿」 泉脈雲根一注淸 한줄기 샘물 구름 이는 곳에서 맑게 쏟아져 連筒流下小槽盈 대나무 홈통을 흘러내려 작은 통에 가득 차네 夜深不夢紅塵事 밤 깊어도 세속의 일 꿈꾸지 않노니 長向窓前作雨聲23) 오래도록 창 앞에서 빗소리 내누나
시인은 절의 창가에 앉아 밤늦도록 잠들지 않고 샘물이 대나무 홈통을 지나 작은 통으로 흘러들어 가며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샘물이 간직한 어떤 의미가 시인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샘물이 가진 의미는 상상을 통해 서술된 起句의 ‘雲根’과 ‘淸’의 호응 속에 나타나 있지만 承句에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나무 홈통을 내려와 작은 통으로 흘러들어 오는 샘물은 그를 담고 있는 좁고 작은 용기들로 인하여 그 맑고 투명함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샘물의 淸淨함은 작품 후반부에 와서 청각적 이미지로 전환되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결국 오래도록 창문 앞에 떨어지는 샘물소리를 듣는 시인의 형상에서 감지되는 것은 그 청정함에 정화되어 마침내 그에 동화된 시인의 내면이다. 매우 시적인 흥취를 일으키는 結句에 다시 주목해보면 이러한 의식경계의 면모를 좀더 시사 받을 수 있다. 샘물은 밤늦도록 창 앞에서 빗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샘물의 소리는 시인을 둘러싼 공간의 고요를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오래도록 샘물 소리를 들으며 정화된 청정한 내면이란 그 안에 고요함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청정한 내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轉句에 따르면 그것은 이 淸淨함과 첨예하게 대조를 이루는 ‘紅塵事’로부터 꿈에서조차 벗어난 맑은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 달리 말해 외부세계의 갖가지 소란과 그로 인한 내면의 온갖 憂愁와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내면경계를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초월의 순간을 포착한 것에 이 시가 가지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대나무 홈통과 작은 통에 담긴 샘물, 그리고 그것이 내는 조용한 소리라는 미소한 사물의 청정함에 시인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척약재의 시를 살펴보면 이 시외에도 맑음을 지닌 작고 연약한 사물의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草間蟋蟀啼無數 풀 숲 사이 귀뚜라미는 무수히 울어대는데 露冷衣寒未久留24) 이슬 차갑고 옷이 싸늘해 오래 머물 수 없네 樹間明月乘昏影 나무 사이로 비치는 밝은 달은 어둠을 타고 나온 빛이요 砌下寒蛩徹夜聲25) 섬돌 아래 귀뚜라미 소리는 밤새도록 우는 소리라 直到夜深淸不寐 다만 깊은 밤 되어도 맑게 깨어 잠못 이루니 隔簾高樹送微凉26) 주렴 너머 높은 나무는 맑은 기운 보내네 禪窓寂寞坐終日 禪窓에서 적막하게 하루 내내 앉았노라니 無數春禽各種聲27) 무수한 봄 새들의 갖가지 울음소리. 閑門欹枕一燈靑 문 닫고 베개에 기대니 등불 하나 푸른데 夜半瀟瀟萬山雨28) 한밤중에 주룩주룩 온 산에 비 내리네
위에 묘사된 청정함은 귀뚜라미 소리, 나무에서 온 맑은 기운, 새소리, 푸른 등불 등 미소한 존재의 맑음이다. 척약재의 시에는 이밖에도 꽃의 맑은 향기나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등의 이미지들이 나타난다.29) 그의 시에 나타난 淸淨의 이미지의 매우 독특한 국면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의상은 그의 섬세하고 예민한 기질이나 성품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정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위에 인용한 자료를 살펴보면 맑음을 드러내는 미소한 존재들이 대부분 어둡고 차가운 공간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맑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어둡고 차가운 의경이 어떤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延昌秋夜」 浙瀝風霜破樹林 거센 바람과 서리 수풀을 부수고 近簷山色更沈沈 처마 가까운데 산빛은 더욱 침침하여라 蕭然獨坐淸無寐 쓸쓸히 홀로 앉아 말갛게 잠 못 이루니 挑盡寒燈夜轉深 차가운 등불 다 돋웠는데 밤은 더욱 깊어가네
이 시는 문집에서의 작품배열 순서와 작품 제목으로 보아 원나라 사신의 입국을 반대하다 竹州에 유배된 무렵에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시를 읽어보면 쓸쓸히 홀로 앉아 잠 못 이루는 시인의 고독과 우수를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창작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살펴볼 때 이 시가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불화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독한 형상의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거센 바람과 서리 그리고 어둡고 둔중한 산빛인 것이다. 이러한 시의 구도는 미련에서도 교묘한 방식으로 반복된다. 꺼져 가는 등불로 암시되는 시인의 정황은 깊어 가는 밤의 어두움과 대조되어 있다. 시인은 등불을 밝히려 하나 오히려 밤의 어두움만이 더해지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시인은 험난한 세계를 암시하는 데 사용한 이미지들이다. 그는 당대의 상황을 주로 차가움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통해 묘사하고 있다. 몰아치는 바람과 서리를 묘사한 起句가 주로 냉엄함 현실을 차가운 이미지로 묘사한 것이라면 承句와 結句는 주로 시대의 암흑을 어둠의 이미지로 형상화하였다. 시대의 어두움과 냉엄함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 이 시의 주된 정서인 것이다.
시대의 현실을 차갑고 어두운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은 그의 시에 빈번히 나타나는 표현기법이다. 특히 온 산에 눈이 내린 추운 겨울 술에 취해 말 가는 대로 가는 시인의 불우한 형상을 묘사한 「馬上吟得二詩, 奉呈河廉使」30)와 찬비 내리는 서늘한 가을밤 술에 취해 갈포 덮고 자는 시인의 형상을 담은 「夜雨醉題」31)는 시대상황을 우회적으로 묘사한 탁월한 작품이다. 이러한 시대에 대한 시인의 대응에는 「偶題」에서와 같이 부드럽고 따뜻한 세계에서의 안온함을 추구하는 자세도 보인다.
柳色千株綠 천 그루 버들 빛 푸르고 桃花萬樹紅 만 그루 복사꽃 붉다 偶然成十酌 우연히 작은 술자리 차렸더니 春雨正濛濛32) 봄비가 부옇게 내리누나
그러나 시를 통해 볼 때 시인의 주된 정신자세는 앞에서 말한 맑고 고요함에의 추구이다. 그렇다면 어두운 세계 속에서 맑음을 간직한 미소한 존재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다음의 시는 이와 같은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淨土蘭若夜吟」 昏昏夢破佛燈明 흐릿한 꿈 깨자 불 등은 밝은데 滿目星河雨已晴 은하수는 눈에 가득하고 비는 이미 개었구나 獨步庭中人不識 홀로 뜨락을 거닐어도 사람들은 모르고 繞籬唯有草蟲鳴33) 울타리를 에워싼 풀벌레 소리만 들리네
이 시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承句의 맑은 의경이다. 잠에서 깬 시인의 눈에 가득 들어오는 것은 밤하늘 은하수의 맑은 빛이고, 그에게 감촉 되는 것은 이미 비가 개인 날씨의 상쾌함이다. 게다가 이러한 맑은 것들은 산 위에 있는 淨土蘭若 위에 놓여 있다. 시인이 이처럼 절 주변의 경관을 맑음의 이미지를 중첩시켜 묘사한 것은 청정함을 지향하는 자신의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오직 풀벌레들만 시인의 마음을 아는 듯 울고 있다. 여기서 적막한 밤에 깨어 맑은 소리로 울어대는 풀벌레의 형상은 외로이 맑음을 지향하는 시인의 형상과 묘하게 겹쳐진다. 여기에서의 풀벌레는 시인의 객관적 상관물이라 할 수 있다. 앞에 인용한 「寄仲賢」에서도 “주렴 걷고 단정히 앉아 긴 휘파람 불 적에, 난간너머 벌레 소리는 시름을 바치네.”라고 하였고 「夜」에서도 “싸늘하게 맑은 기운 흡사 가을날 같은데, 강기슭을 두른 벌레소리 나그네 시름을 위로하네.”34)라 하여 척약재 시에서 풀벌레가 시인의 객관적 상관물로 흔히 등장함을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시인 자신의 형상과 겹쳐지는 이 미소한 존재들의 맑음이 내포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맑고 고요한 이미지와 차갑고 어두운 이미지가 공존하는 다음 작품에서 이 맑음의 의미는 또렷이 드러난다.
「夜坐」 明月透嘉樹 밝은 달빛이 아름다운 나무 사이로 비치고 微凉生戶庭 서늘한 기운이 뜨락에 피어오를 때 露深驚帽重 이슬이 흠뻑 내려 모자 무거워짐에 놀라고 陰密怕衣輕 그늘 짙어 옷이 얇을까 걱정하네 怖鵲林間叫 겁먹은 까치는 수풀 사이에서 우짖고 寒虫草底鳴 찬 기운 속 벌레는 풀 밑에서 우는구나 道心元杳杳 道心은 원래 아스라한 것 沈寂有餘淸35) 고요 속에 맑은 기운 남아 있네.
이 시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표출된 이미지에 있어 맑고 고요함과 차갑고 어두움이 교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이다. 시인은 분명 首聯에서 맑은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 듯하지만 頷聯부터는 은밀하게 그 어둡고 차가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頷聯의 出句에 맑은 이슬이 등장하긴 하나 그것은 시인으로 하여금 모자가 무거워짐에 놀라게 하고 對句에서 서늘한 그늘이 나타나긴 하지만 옷이 얇음을 걱정하게 한다. ‘驚’과 ‘怕’라는 시인의 심리적 동태는 여기에 담긴 이미지가 차갑고 어두운 것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의미는 경련에 와서 더욱 또렷이 나타난다. 숲 속에서 우짖은 ‘怖鵲’의 ‘怖’는 가을의 차가운 기운으로 인한 까치의 두려움이며 ‘寒虫’의 ‘寒’도 풀벌레를 둘러싼 가을의 차가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怖鵲’과 ‘寒虫’은 차갑고 어두운 세계에서 억압받는 연약한 존재들을 비유한다. 특히 풀 밑의 ‘寒虫’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풀밑에서 맑고 가는 소리로 울어대는 가을 벌레란 이 어두운 시대에 맑음을 추구하는 시인 자신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尾聯에서 시인이 道心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 가을 풀벌레가 지닌 맑음이란 차갑고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시인이 애써 지키고자 하는 맑고 고요한 본연의 마음 곧 良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道心은 원래 아스라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억압 속에서 양심 곧 道心을 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시인은 고요함 속에 남은 맑음이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어둡고 험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맑은 본성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시인의 맑고 고요함에의 추구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의 양심의 문제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시의 진술에서도 시사 받을 수 있다.
瀟灑關東山水裏 소쇄한 관동의 자연 속에서 安能碌碌釣名爲36) 어찌 녹녹하게 명성을 낚기나 하랴 閉門終不接庸流 문 닫고 종일토록 용렬한 무리 접하지 않노니 只許靑山入我樓 단지 푸른 산이 내 누각에 들어옴만 허락하네 樂只吟哦慵便睡 즐거우면 시 읊조리고 무료해지면 조나니 更無餘事到心頭37) 달리 내 마음에 이를 일이 없네
결국 미세한 것의 맑음에 대하여 시인이 지속적으로 노래했던 것은 당대의 암흑과 시련 속에서 위태롭게 양심을 지켜가려는 정신적 지향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서 시인 자신에 대한 대표적 상징물인 풀벌레와 그 울음소리를 연상해 보면 그가 미소한 물상을 통하여 어떤 의미를 전달하여 했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풀벌레는 우선 깊은 밤에도 깨어있는 존재이다. 그것의 울음소리는 가볍고 맑은 소리의 울림으로 형언하기 어려운 맑음을 느끼게 한다. 더구나 이는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끝없는 울림이다. 시인은 어두운 시대의 위압과 자신의 미소함에도 세상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순수한 맑은 정신을 지켜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맑음을 현시하는 미세한 물상들의 이미지들을 주목해 보면 그것들이 대개가 動態로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정확하게 지적한다면 시냇물 소리, 귀뚜라미 소리, 봄 새소리 등이 시사하듯이 맑되 매끄러운 소리의 움직임이다. 말하자면 고요하면서도 의식을 각성시키는 그러한 소리들이다. 이는 시인이 지향하는 내면이 고요함과 움직임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어울림의 상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면모는 다음 시를 통해 더욱 또렷이 확인된다.
「寄李存吾」 夜久坐南軒 밤 깊어 남쪽 난간에 앉으니 庭陰露泫然 뜰의 응달엔 이슬이 흥건하네 螢飛度簾外 반딧불은 주렴 밖으로 가로질러 나르고 虫泣近床前 벌레는 침상 앞으로 울며 다가오네 氣靜仍無夢 氣가 고요하니 꿈도 없고 心淸竟不眠 마음이 맑아 끝내 잠들지 못하네 誰知到如此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면 自是傲神仙38) 절로 신선도 업신여기게 되는 줄 누가 알랴
깊은 밤 홀로 앉아 있는 시인 주변의 미세한 사물들은 한결같이 淸淨함을 또렷이 현시해 주는 물상들이다. 그늘 속에 맑게 맺혀 있는 이슬은 영롱하게 빛나고 꼬리의 불을 반짝이며 날아가는 반딧불은 캄캄한 밤의 배경을 통해 淸明함을 더욱 드러낸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가을 벌레는 가늘고 맑은 소리로 다가온다. 시인의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이러한 심상들은 모두 고요하면서도 정채를 발하는 그러한 이미지들이다. 다시 말하여 고요함과 움직임이 어울려 있는 깨어 있는 明澄한 정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경련에 와서 자신의 내면에 대해 꿈이 없을 만큼 고요하고 잠이 들지 않을 만큼 깨어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매우 각성된 정신경계에 도달한 시인은 마침내 호연한 흥에 겨워 신선을 업신여기는 경지를 자부하고 있다. 특히 신선을 업신여긴다고 한데서 시인의 정신적 자유로움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살펴보면 그가 성취한 내면경계는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 자신을 지켜나가고자 했던 良心이면서 자신의 범속성 일상성마저 벗어나게 된 자유로운 정신경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신경계는 곧 옛 선인들이 소위 ‘敬’으로 일컬었던 統覺상태를 의미한다. 척약재가 ꡔ大學ꡕ을 朝夕으로 반복하여 읽어 정밀하게 체득했다는 목은의 증언이나 척약재의 字가 敬之인 점, 그리고 「惕若齋銘」에서 그의 벗 정도전이 敬을 강조했던 점39) 등은 이러한 그의 정신경지를 시사해 준다. 무엇보다도 척약재 자신이 앞에 인용했던 「漫成」에서 “敬을 주로 하고 義를 실천하는 것이 군자다.”라고 敬을 강조했던 사실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明澄한 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척약재의 청정함에의 지향의 현실적 의미라고 할 때 이러한 인격적 면모가 生活에 녹아 있는 국면을 포착한 작품들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에는 현실의 삶 속에 배태된 憂愁를 떨쳐버린 희열의 정조가 나타난다.
「山居」 浩然天地一狂生 드넓은 천지의 한 狂生 獨臥靑山弄月明 홀로 푸른 산에 누워 밝은 달 희롱하네 自笑邇來無世味 요즈음 세상재미 없어졌음에 스스로 웃노니 竹根流水洗心聲40) 대나무 뿌리에 흐르는 물은 내 마음 씻는 소리라네
이 시에 나타난 푸른 산에 홀로 누워 있는 狂生 그리고 세상의 재미가 사라진 요즈음의 심경 등은 시인의 우울하고 고독한 심경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아니다. 그러한 표현들이 밝고 긍정적인 의미로 읽히는 매우 청신하며 흥취가 넘치는 結句의 묘사로 인해서이다. 대나무 뿌리 사이로 흐르는 물이 마음을 씻어주는 소리라는 평이하면서도 참신한 이미지는, 자연물을 매개로 마음의 정화를 이룬 시인의 내면을 드러낸다. 여기에 의거해 보면 시인은 푸른 산 밝은 달 그리고 대나무와 그 아래로 흐르는 산골 물 등으로 이루어진 淸淨한 공간에서 정신적으로 고양되어 세상 재미를 잊어버렸음을 알 수 있다. 좀더 구체화해본다면 浩然天地와 一狂生을 병치한 起句의 진술은 천지를 벗하며 사는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시인을 드러낸다. 이 자유로운 존재는 청산에 누워 달빛을 희롱하는 시인의 형상을 통하여 더욱 확연하게 제시된다. 특히 여기에 보이는 단순하고 담담한 표현은 이러한 면모와 묘하게 어울리면서 그의 호연한 흥을 전해주는 듯하다. 시인이 전반부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형상을 표현했다면 작품의 후반부에 와서는 내면의 희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笑’가 그 뚜렷한 징표가 되겠지만 보다 이를 농후하게 전해주는 것은 요즘 세상 재미조차 없어졌다는 시인의 정신적 원숙함과 흐르는 물소리가 洗心聲이라는 깨달음에 있다. 이 시를 한 호흡에 읽어내려 가게 되는 것도 여기에 시인의 호연한 흥과 희열의 정서가 배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작품에서도 “해지고 구름 걷히자 달빛 뜰에 가득한데, 한 동이 술로 친구를 마주하네. 瑞香花가 가까우니 향기는 안개처럼 짙고, 얼굴을 스치는 맑은 바람 산들산들 불어오누나.”41)라고 하여 맑음을 지향하는 삶에 배어 있는 희열의 정조를 드러낸다. 그런데 척약재의 시들 중에는 이러한 삶의 양태가 보다 은밀한 방식으로 형상화되어 시적 감흥을 일으키는 작품이 있다. 「驪江五絶, 寄遁村李浩然」이라는 題下의 몇 작품이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데 그 중 한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驪江五絶, 寄遁村李浩然」 第三 月色江聲暑氣微 흐르는 달빛 강물소리에 더운 기운 가시는데 老魚時復近苔磯 살진 물고기는 이따금 다시 이끼 낀 낚시터에 다가오네 收絲卷棹人無事 낚시 줄 거두고 노 치우자 할 일이 없어 穩放輕舠緩緩歸42) 느긋하게 가벼운 배 놓아 느릿느릿 돌아오네
이 시는 강가 낚시터 주위의 경관과 낚시 갔다가 돌아오는 시인의 동작을 묘사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깊이를 암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물고기가 노니는 맑은 강물과 주변의 경관이 그의 내면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로 시인의 행동이 어떤 이상적인 人格이나 生活을 시사하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다.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시인이 물고기 잡는 데 무관심하다는 사실이다. ‘老魚’가 이따금 ‘다시’ 낚시터에 다가온다는 承句의 진술은 시인이 물고기를 잡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힌다. 물고기가 살져 있다는 표현과 그 고기가 두려움 없이 낚시터 근처로 다가온다는 언급에서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물고기를 잡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 시인의 행동은 바로 세속적인 利欲으로부터 벗어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는 낚시 줄을 거두고 노까지 거두는데 노를 거둔다는 것은 結句가 시사하는 대로 집으로 급히 돌아가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無事’라는 언급에서도 시사되어 있지만 삶의 계획․노력 따위의 인위적인 경영이 없음을 의미한다. 가벼운 배가 물살에 따라 제멋대로 떠가듯이 시인은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나 자신의 생명욕구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결국 天眞한 人格에 바탕한 담박한 생활태도를 의미한다. 목은이 이 시에 차운하여 “道情이 일어난 곳에 世情이 은미하니 活句는 옛부터 범하기 어렵다.”43)라고 읊은 것은 이러한 생활정조를 간파했기 때문이다.
같은 제목 아래 작품 가운데, ‘淸淨한 강가에서 詩句를 읊조리며 고깃배로 올라가는’ 시인의 형상을 묘사하여 세속의 분란에 물들지 않은 순결한 삶의 자세를 보여준 제1수나 ‘한밤중 강가에서 깨어나 움직이는 산과 언덕을 보고 시인 자신이 배에 타고 있었음을 문득 깨닫는다’는 내용을 담아 맑은 자연과 어울려 자신조차 잃어버린 순박한 삶을 시화한 제4수도 위의 시와 의미맥락을 같이 하는 뛰어난 작품이다.
척약재는 명징한 정신과 순결하고 담박한 삶을 지향하였고 더 나아가 자신의 내면과 같은 맑은 세계가 당대 정계 나아가 고려에 실현되기를 희원하였다. 송도의 소쇄한 산천을 묘사한 뒤 시대를 구제할 호걸 같은 선비가 많음을 노래한 「松京曉望」44) 같은 작품은 그 징표라 할 만하다. 그리고 가을 풀벌레 소리처럼 맑게 깨어 있는 그의 정신은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의 양심이었기에 앞에서 예시한 의롭고 과감한 삶의 행적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다.
4. 맺음말
척약재 시에는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여성적인 어조를 지닌 작품들이 많다. 특히 여성정감을 노래한 작품들은 시인 자신의 상실감과 그리움을 섬세하고 짙게 보여준다. 여성적인 어조와 여성정감을 담은 시들에 드러난 이러한 의식은 세계의 폭압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보다는 자신을 지켜나가려 했던 그의 삶의 자세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이와 연결되어 그의 시에는 悲憤慷慨의 정조보다는 짙은 憂愁와 孤獨感이 자주 나타난다. 이는 유가의 정치이상을 달성하고자 했던 젊은날의 포부가 좌절된 상황과 자신과 뜻을 같이 했던 아우 齊顔이 신돈에 의해 처형당했던 참담한 경험에서 파생하였고 거시적으로는 ‘天眞을 상실한 세계’라는 그의 부정적인 세계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척약재의 시에는 풀벌레 소리, 새소리, 맑은 향기, 시냇물 소리 등 미세한 존재들이 지닌 맑음을 형상화한 이미지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맑음을 지닌 미소한 존재들은 대개가 차갑고 어두운 공간에 놓여 있다. 이 차갑고 어두운 이미지는 시대의 암흑을 암시하고 이와 대조되는 맑고 고요한 이미지는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 위태롭게 지켜나가는 시인의 良心을 상징한다.
어둡고 차가운 세계 속에 맑게 깨어있는 명징한 정신을 시화한 척약재의 시는 세계의 폭압에 처한 인간존재의 미약함에 대한 응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드러낸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내향적인 인간의 한 전형적인 삶의 자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또 척약재의 시가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가 묘사한 내면의 맑음이 마음의 근원적인 상태를 탁월하게 포착했기 때문이다. 그의 시는 맑고 미세한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고요하면서도 맑게 깨어 있는 명징한 정신을 미묘하게 암시하고 있다. 고요함과 움직임이 교묘하게 어울려 있는 心態에 대한 묘사는 한편으로 깊은 시적 흥취를 일으키면서 또 한편으로 그가 도달한 정신경계의 높이를 보여준다.
질의 요지
(2) “金九容 시의 淸淨함에 내포된 정신적 의미에 대하여”에 대한 질의
김 보 경 (이화여대)
선생님의 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김구용 시의 특질을 ‘淸’․‘淸淨’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그의 정신적 明澄性과 결부시켜 논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발견되는 내적 특질과 시인의 정신적 세계를 관련지어 논하는 시도는 무척 유익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논문을 읽고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을 여쭙고, 아울러 몇 가지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선생님께서는 “고려말 시인들의 작품에 ‘淸’ 風格의 시가 흔히 나타나고 전체적인 작품세계가 淸의 미감을 지닌 것으로 일컬어지는 시인들도 있”(64쪽)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淸’의 풍격이 고려말 시인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라면, 이것을 이 시대를 산 시인들의 공통적인 정신적 특질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왜 이 시대에 이러한 특질이 나타나게 되는가, 다른 시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만의 특질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선생님께서는 諸家들이 김구용의 풍격을 ‘淸’이라는 미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64쪽) 그런데 그 중 李穡의 평이라고 하신 부분은 몇 가지 짚고넘어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색은 <척약재학음후> 첫머리에서 閔思平의 시는 “造語平淡, 而用意精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天趣를 얻었다.”고 한 것은 李齊賢이 閔思平의 詩法을 탄식했던 말로서, 이색은 이것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김구용은 외조 閔思平의 집에서 생장하고, 외조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외조로부터 받은 영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문인들은 김구용의 학문과 문학을 논할 때 늘 민사평을 의식했습니다. 이색 또한, 먼저 민사평의 시가 이러하다 해놓고, 김구용의 시법이 민사평과 “絶類”하다고 했습니다.
이 때 “絶類”하다고 한 시법은 바로 ‘平淡精深’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平淡’은 이색이 대단히 사랑했던 詩格입니다. 그는 平淡의 陶淵明을 사랑했고, 詩道를 중흥하는 방법은 도연명과 같이 ‘天心’과 합하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ꡔ목은시고ꡕ, 권8, <讀歸去來詞>) 인위적인 수식이 가해지지 않은 평이하고 담박한, 자연스러운 시적 경계를 지향한 것입니다. 이제현이 민사평의 시를 말하면서 언급한 ‘天趣’도 이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平淡’ 또는 ‘天趣’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淸’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이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한편, “붓을 대면 雲煙이 일어나는 듯”하다고 한 것은 許筠이 ꡔ惺叟詩話ꡕ에서 李穡의 말을 인용해 평한 것으로, 申緯의 <東人論詩絶句>에서도 거듭 나옵니다. 그런데 이 때 ‘雲煙’은 ‘淸’이 아니라 막힘 없이 물 흐르는 듯한 필력 곧 ‘贍’을 두고 이른 말로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선생님께서 李穡의 평이라고 쓰신 부분에서는 김구용의 ‘淸’과 직결되는 내용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2.2. 선생님께서는 ‘2. 憂愁의 정조와 부정적 세계인식’에서 먼저 “나직하고 섬세한 여성적 어조로 그리움과 상실감을 노래한 작품”들을 살피셨습니다.(65쪽)
김구용의 ꡔ척약재학음집ꡕ에는 7수의 詞가 실려 있고(이 역시, 詞에 뛰어났던 외조 민사평으로부터 영향받은 바 크겠지요), 그 중 3수가 ‘代人作’입니다. 선생님께서 처음에 거론하신 <卜算子>도 그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작품이, “자신의 억제하기 어려운 상실감을 참신하고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66쪽)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이 시가 동시대 문인들의 시와 어떻게 다른지, 어디가 ‘참신’하고 ‘섬세’한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여성적 정감’의 문제입니다. 이 작품이 “여성 화자가 이별의 情恨을 토로한”(65쪽) 것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代人作’인 점을 감안할 때 여기에서 드러나는 여성 정감을 곧바로 김구용 자신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代人作임을 감안하지 않은 채 거기에서 드러나는 여성 정감을 가지고서, 김구용을 “세계의 폭압에 저항하기보다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내향적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다른 작품을 통해서 이런 기질을 추출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長相思>과 <畵堂春> 역시 詞로서 대인작입니다. 한편, <寄李丹陽>은 이 작품들과는 또 다릅니다. 이것은 친우 사이에 그리는 정을 노래한 것 이상은 아닙니다.
2.3. 선생님께서는 김구용 시의 “전체적인 어조는 부드럽고 나직하”(67쪽)다고 하셨습니다. 이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언급은 안 하셨지만, 선생님께서는 아마도 이 또한 여성적 어조라고 보실 듯합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이것은 여성적 어조라기보다는 ‘靜’의 지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선생님께서는 “나직하고 섬세하고 여성적인 어조로 그리움과 상실감을 노래한” 이들 작품에 대해서 “그의 삶을 빛나게 했던 과감한 행적들”에서 “예견되는 기질과는 사뭇 거리가 있는 듯한”(65쪽)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가 “세계의 폭압에 저항하기보다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내향적 기질의 사람”이었다면, “그의 삶을 빛나게 했던 과감한 행적”들은 과연 어떻게 설명 수 있는 것인지요? 그 괴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선생님께서는 여성 정감을 읊은 작품들에 이어서 憂愁와 孤獨感을 읊은 시를 살피고, 이러한 정서가 나타나는 이유를 “유가적 이상사회의 실현”이라는 “거대한 삶의 목표의 좌절”에서 찾으셨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삶의 현실 위”에서도 삶의 깊은 고뇌가 파생된다고 하셨습니다.(68쪽)
먼저 개인적 삶의 현실부터 말하자면, 김구용은 다른 문인보다 ‘더 깊은 고뇌’에 빠질 만큼 불우한 처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는 安東 金氏 가문의 후손이고 그의 외가는 黃麗 閔氏 가문입니다. 그가 안팎으로 떠르르한 世族 가문의 자손이라는 점은 동시대 문인들에게 늘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아우 金齊顔이 신돈 주살 모의에 참여했다가 처형당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으나, 김구용 자신은 신돈 집권하에서 성균관의 교관으로 있었고, 斯文이 흥기하고 盛世가 도래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노래했습니다. 그와 함께 어울린 정몽주․박상충․박의중․이숭인 등은 공민왕대에 성장한 새로운 세대의 문인으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학습하면서 그 가르침을 세상에 펼치는 것을 궁극적인 이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때로 현실에 의해 좌절하곤 했으나, 고려 사회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2.5. 이것은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적 세계인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김구용이 “개인적 불행으로부터 사회․국가의 혼탁함에 이르는 이 세계의 혼란이 이 眞의 상실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다.”(69쪽)고 하시면서, 그의 시에 나타난 憂愁의 정조를 ‘부정적인 세계인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에 우수와 고독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가지고 그가 ‘부정적인 세계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漫成> 첫 구에 나오는 ‘太眞’은 太極(의 氣)을 의미합니다. 이 ‘태진’이 크게 잘못되어 티끌과 섞인다는 것은 분명 부정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현상’이지 잘못된 ‘근원’이 아닙니다. 이 시에서는 결구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봄은 원래 호연한 봄”이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만물의 발생을 볼 때 태극이 근원이고, 사시로 볼 때 봄이 그 처음입니다. 김구용이 “봄은 원래 호연한 봄”이라고 맺은 것은, 得喪과 興亡이 갈마들고 거짓과 명예를 낚는 일이 판을 쳐도, 그 근원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가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이라면, ‘태진’이 크게 잘못되어 나타난 현실, 근원이 제대로 발현되어 운행되지 못한 현실입니다.
거론하신 <延昌秋夜> 등의 작품에서 “시대의 어두움과 냉엄함에 대한 깊은 절망감”(71쪽)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김구용은 궁극적으로 근원 세계의 바름을 믿었고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견지했습니다. 봄은 원래 호연한 봄이라는 생각, 그것이 김구용이 어둡고 냉엄한 현실 속에서도 줄기차게 明澄한 정신으로 깨어 있으면서 ‘淸’을 노래했던 이유가 아닐까요?
3.1. 선생님께서는 김구용 시에서 ‘淸’ 또는 ‘淸淨’의 특질을 주목하고, “이 참됨(眞)은 흔히 淸淨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다.”(69쪽)고 하고,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明澄한 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척약재의 청정함에의 지향의 현실적 의미”(74쪽)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淸’을 말씀하시면서 ‘靜’을 아울러 언급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釋房寓宿>을 설명하시면서 “오래도록 샘물 소리를 들으며 정화된 청정한 내면이란 그 안에 고요함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70쪽)이라고 하신 것이 그 한 예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淸’과 ‘靜’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3.2. 김구용 시를 읽어 보면 ‘淸’과 ‘靜’이 아울러 나타난 것이 많고, ‘靜’이 ‘淸’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李穡은, 金九容과 金齊顔 형제는 두 사람 모두 뛰어난 인재이나, 김제안은 그 날카로운 기운을 억누르지 못해 辛旽에 대항하다가 마침내 화를 입었다 하고, 김구용은 “조용히 들어앉아 외물을 거스르지 않았으며[恬靜自居, 不牾於物] 깊이 유학의 가르침을 음미하여 綱目이 모두 ꡔ大學ꡕ 책 한 권에 있다고 여겼으니 밤낮으로 되풀이해서 읽고 자세하게 체득하여 일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한결같이 이 책에서 나왔다. 이른바 스스로 만족하는 자는 遺恨이 없는 경우이다.[自慊者已無遺]”(66-67쪽)라고 했습니다.
이 “恬靜自居, 不牾於物”, “自慊者已無遺恨”이 바로 김구용의 삶의 자세이며 내면적 특장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앞에서, “척약재 시의 전체적인 어조는 부드럽고 나직하며 시에는 세계를 마주한 자아의 적극적인 행동에의 의지나 불의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67쪽)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와 내면적 특장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시에 ‘悲憤慷慨’의 정조나 ‘豪氣로움’이 드문 것 또한 이로써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3.3. 김구용은 “氣靜仍無夢, 心淸竟不眠.”이라고 했고, 많은 시에서 ‘靜’의 공간을 등장시키거나 또는 ‘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시적 공간이나 분위기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朱子는 ‘靜’을 존중했는데, ‘靜’의 존중은 周敦頤와 程頤가 선구입니다. 程頤는 周敦頤의 ‘主靜’의 ‘靜’ 자를 피하고 ‘敬’자로 대체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다만 표현을 바꾼 것입니다. 程頤는 ‘敬’을 ‘主一無適’으로 해석했고, 朱子는 이 程頤의 敬 사상을 계승했습니다. ‘靜’이란 ‘性의 본래성’이며, ‘敬’은 그 본래성을 보존하고 주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구용이 자신의 삶과 시에서 지속적으로 ‘靜’을 지향․실천한 것에서, 아울러 김구용의 字가 ‘敬之’이고 그가 <漫成>에서 “主敬行義乃君子”라고 한 것에서, 그리고 <惕若齋箴>(이달충)과 <惕若齋銘>(이색․정도전)에서 ‘敬’이 줄곧 강조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김구용이 마음의 본래성을 지키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있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3.4. 선생님께서는 <寄李存吾>에서 “이런 시각에서 살펴보면 그가 성취한 내면경계는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 자신을 지켜나가고자 했던 良心이면서 자신의 범속성 일상성마저 벗어나게 된 자유로운 정신경지임을 알 수 있다.”고 하고, 이어서 “이러한 정신경계는 곧 옛 선인들이 소위 ‘敬’으로 일컬었던 統覺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74쪽) 그러나 저로서는 이 시의 정신경계가 어째서 “옛 선인들이 소위 ‘敬’으로 일컬었던 統覺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淸’에 대해서만큼 ‘靜’의 정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淸’과 ‘靜’의 관계, 그리고 이 둘과 ‘敬’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太眞’, ‘眞淳’, ‘眞隱’, ‘天眞’(69쪽) 4.2. “月滿雪深山閣靜, 自春元只浩然春”(68쪽) / “誰知到如此, 自是傲神仙”(73쪽) 4.3. “초월의 순간”(70쪽) ≪바로가기 : http://file.blogn.com/kohanhak/2002춘계요지집.hwp≫
8) 金九容 詩의 現實認識과 風格 (2005. 12. 24. 발용(군) 제공)
출전 : <한국한시학회>에서 매년 발행하는 학회지 제5호(1997년)에 게재되었던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