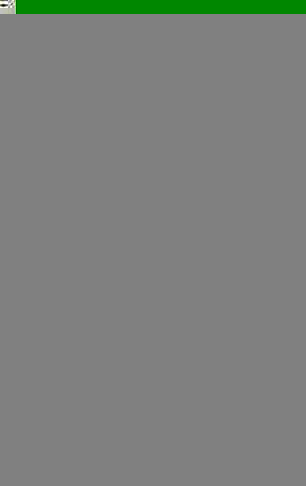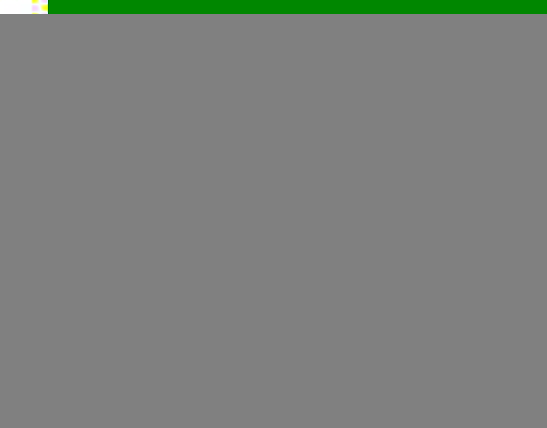본문
|
|
|
11) 내방가사 <규원가> 소개 (2002. 2. 14 항용(제) 제공)
규원가(閨怨歌)
[작품 해제] 조선조 중기의 여류 시인 허 난설헌이 지은 가사. 봉건 제도하에 서의 규방(閨房)의 애달픈 생활을 노래한 것이다. '고금가곡(古今歌曲)'에 전하는데 조선 시대 여성의 생활상을 잘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흥미 있는 작품이다.
엊그제 점엇더니(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늘거니(늙었는가) 少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말하여도) 속절없다.(아무 소용 없다.) 늙어야 설운 말삼(말씀) 하자 하니 목이 멘다. 父生母育 辛苦(신고)하야 이 내 몸 길러 낼 제, 公侯配匹(고귀한 사람의 배필이 됨)은 못 바라도 君子好逑(군자 호구:군자의 좋은 배필) 願하더니, 三生(前生,今生,來生)의 怨業(원업)이오 月下의 緣分(연분-월하 노인이 맺어 준 연분)으로, 長安 遊俠(장안의 풍류객) 輕薄子(행동이 경박한 사람)를 꿈같이 만나 있어, 當時의 用心하기(마음쓰기) 살얼음 디디는 듯, 三五 二八(15∼6세) 겨오 지나 天然麗質(타고난 고운 얼굴과 고운 마음씨)절로 이니, 이 얼골 이 態度(태도)로 百年期約하였더니, 年光이 훌훌하고 造物이 多猜(다시)하야(시기하여) 봄바람 가을 믈이 뵈오리(베의 올) 북(실꾸리를 넣는 나무통) 지나듯 雪빈花顔(설빈화안:고운 머리채와 아름다운 얼굴) 어데 두고 面目 可憎(가증) 되거고나. 내 얼골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괼소냐?(사랑할 것인가?) 스스로 斬愧(참괴)하니(부끄러워하니) 누구를 怨望(원망)하리. 三三五五 冶遊園(야유원,기생집)에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꽃 피고 날 저물 제 定處(정처) 없이 나가 있어, 白馬 金鞭(금편)으로 어데 어데 머므는고. 遠近(원근)을 모르거니 消息(소식)이야 더욱 알랴? 因緣(인연)을 그쳤은들 생각이야 없을소냐? 얼골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르려믄(말려무나) 열 두 때 김도 길샤(길기도 길 구나) 설흔 날 支離(지리)하다. 玉窓(옥창)에 심은 梅花 몇 번이나 피어진고?(피고 졌는가?) 겨울 밤 차고 찬 제 자최눈(자국 눈) 섞어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궂은 비는 므스 일고? 三春花柳 好時節에 景物(경물,경치)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귀뚜라미)이 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헴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靑燈(청등:푸른 등)을 돌라 놓고 綠綺琴(녹기금:푸른 거문고) 빗기 안아, 碧蓮花(벽련화) 한 곡조를 시름 조아 섞어 타니, 瀟湘(소상:중국에 있는 강. 주1) 夜雨(야우)에 댓소래 섯도난 듯,(섞여 도는 듯) 華表(화표) 千年(주2)에 別鶴(별학)이 우니는 듯. 玉手의 타는 手段(수단) 옛 소래 있다마는, 芙蓉帳(부용장) 寂寞(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肝腸(간장)이 九曲하여 구븨구븨 끊쳤어라.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즘생, 무슴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는다? 天上의 牽牛織女(견우 직녀) 銀河水(은하수) 막혓어도, 七月七夕 一年一度 失期(실기)치 아니커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슴 弱水(약수) 가렸관디, 오거나 가거나 消息(소식)조차 끄쳤는고? 欄干(난간)에 비겨 서서 님 가신 데 바라보니, 草露(초로)는 맺혀 있고 暮雲(모운)이 지나갈 제, 竹林(죽림) 프른 곳에 새 소리 더욱 설다. 세상에 설운 사람 수 없다 하려니와, 薄命(박명)한 紅顔(홍안)이야 날 같은 이 또 있일가?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까닭으로) 살동말동 하여라.
<주해> 주1. 동정호(洞定湖) : 남쪽에 있는 두 강의 이름 '소상 야우'는 소상 팔경(八景)의 하나로, 순제(舜帝)를 찾아 헤매던 두 비의 넋이 비가 되었다 함. 주2. 화표 천년 : 옛날 요동 땅에 정 영위(丁令威)라는 이가 영허산(盈虛山)에 가서 도를 배운 뒤 학(鶴)이 되어 천 년 만에 돌아와 화표문에 앉았다 함
<全文 현대어 풀이문> 엊그제 젊었더니 어찌 벌써 이렇게 다 늙어버렸는가? 어릴적 즐겁게 지내던 일을 생각하니 말해야 헛되구나. 이렇게 늙은 뒤에 설운 사연 말하자니 목이 멘다. 부모님이 낳아 기르며 몹시 고생하여 이 내 몸 길러낼 때, 높은 벼슬아치의 배필은 바라지 못할지라도 군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바랬더니, 전생에 지은 원망스러운 업보요, 부부의 인연으로(불교의 윤회 사상) 장안의 호탕하면서도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 시집간 뒤에 남편 시중들면서 조심하기를 마치 살얼음 디디는 듯 하였다.(결혼을 운명으로 여기고 힘든 시집살이를 견딤) 열다섯 열여섯 살을 겨우 지나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 저절로 나타나니, 이 얼굴 이 태도로 평생을 약속하였더니, 세월이 빨리 지나고 조물주마저 다 시기하여 봄바람 가을물, 곧 세월이 베틀의 베올 사이에 북이 지나가듯 빨리 지나가 꽃같이 아름다운 얼굴 어디 두고 모습이 밉게도 되었구나. 내 얼굴을 내가 보고 알거니와 어느 님이 사랑할 것인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여러 사람이 떼지어 다니는 술집에 새 기생이 나타났다는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없이 나가서 호사스러운 행장을 하고 어디어디 머물러 노는고? 집안에만 있어서 원근 지리를 모르는데 님의 소식이야 더욱 알 수 있으랴. 겉으로는 인연을 끊었다지만 님에 대한 생각이야 없을 것인가? 님의 얼굴을 못 보거니 그립기나 말았으면 좋으련만, 하루가 길기도 길구나. 한 달 곧 서른 날이 지리하다. 규방 앞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고? 겨울 밤 차고 찬 때 자국 눈 섞어 내리고, 여름날 길고 긴 때 궂은 비는 무슨 일인고? 봄날 온갖 꽃 피고 버들잎이 돋아나는 좋은 시절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아도 아무 생각이 없다. 가을 달 방에 들이 비추고 귀뚜라미 침상에서 울 때 긴 한숨 흘리는 눈물 헛되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돌이켜 여러가지 일을 하나하나 생각하니 이렇게 살아서 어찌할 것인가? 등불을 돌려 놓고 푸른 거문고를 비스듬히 안아 벽련화곡을 시름에 싸여 타니, 소상강 밤비에 댓잎 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 망주석에 천 년만에 찾아 온 특별한 학이 울고 있는 듯, 아름다운 손으로 타는 솜씨는 옛 가락이 아직 남아 있지마는 연꽃 무늬가 있는 휘장을 친 방이 텅 비었으니 누구의 귀에 들릴 것인가? 마음 속이 굽이굽이 끊어졌도다.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님을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서 우는 벌레는 무슨 일이 원수가 되어 잠마저 깨우는고? 하늘의 견우성과 직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을지라도 칠월 칠석 일년에 한 번 씩 때를 어기지 않고 만나는데,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장애물이 가리었기에 오고 가는 소식마저 그쳤는고? 난간에 기대어 서서 님 가신 데를 바라보니, 풀 이슬은 맺혀 있고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대 수풀 우거진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세상에 설운 사람 많다고 하려니와 운명이 기구한 여자야 나 같은 이가 또 있을까? 아마도 이 님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
<해설 및 정리> ▲ 연 대 : 선조때로 추정 ▲ 종 류 : 가사(歌辭: 내방 가사) ▲ 성 격 : 원부사(怨夫詞) ▲ 주 제 : 봉건 제도하에서의 부녀자의 한 ▲ 의 의 : 규방 가사의 선구적인 작품. 현전하는 최고의 여류 가사 ▲ 내 용 : 남존 여비의 유교 사회에서의 한스러운 생활과 괴로움을 노래
* <교주가곡집>의 규원가 소개 (2003. 6. 22. 태서(익) 제공) (1)<교주 가곡집> 차례
(2)<규원가> 본문 사진
* <교주가곡집> : 구한말에 편찬된 우리 나라 노래집. 17권 17책. 시조, 가사, 잡가 등 도합 1,789수가 수록. 일본인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1868~1942]가 경성제국대학 재직시 편찬. (규원가(閨怨歌))는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의 가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