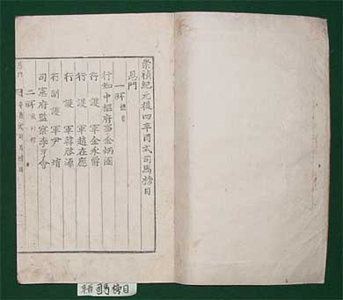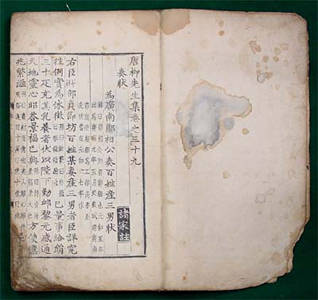본문
|
|
|
3) 갑인자-제작에 부윤공 참여함 (1) 갑인자로 인쇄된 서적 및 활자 소개 (2002. 12. 19. 출전:한국고미술 네트워크 자료)
향예합편 사마방목 창여집 동파선생 시 문 선 진서산독서기 대학연의 당유선생집
(2) <금속활자에 대해> (2003. 1.9 영환(문) 제공)
금속활자(金屬活字) 금속으로 만든 활자. 주자(鑄字)라고도 한다. 금속활자는 재료에 따라 동활자(銅活字) · 철활자(鐵活字) · 연활자(鉛活字)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동활자는 놋쇠활자를 말하며, 가장 많이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그 합금의 성분은 구리 · 아연 · 주석 · 납 · 철 등으로 되어 있는데, 활자마다 구성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철활자는 무쇠활자라고도 하며 관서와 민간에서 만든 것이 몇 종 있다. 연활자는 주석활자라고도 일컬으며 옛 활자로서는 1종이 전하고 있을 뿐이다.금속활자의 발명과 사용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원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기원설이 몇 종 있으나, 초기의 기록 또는 실물이 전해지지 않아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먼저 “1102년(숙종 7)의 기원에서 문종 때인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설이 있다. 11세기의 기원설은 1102년 처음으로 고주법(鼓鑄法)에 의하여 엽전을 주조하였는데, 그 방법이 금속활자의 인쇄를 시창하게 한 것으로 본 견해이다. 고주의 방법은 일찍이 한나라 때부터 행하여졌던 것으로서 《한서 漢書》 가운데 여순(如淳)의 주해에 의하면, “동철을 불리기 위하여 부채질로 불을 벌겋게 일으키는 것.”이라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주물(鑄物)을 불리는 데 고주법을 사용해왔다.
1022년(현종 13)에 현화사(玄化寺)에서 범종(梵鐘)을 만들기 위하여 동철을 불리는 데도 고주법을 썼음이 기록에 나타나 있고, 1102년에 엽전을 만드는 데도 적용하였다. 이 설은 글자가 들어 있는 엽전을 주조해낼 수 있다면 활자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제한적 해석을 한 데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활자를 주조할 수 있는 전체적 여건은 진작부터 갖추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활자인쇄 의 창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금속활자의 기원을 11세기로 추정한 것은 김부식(金富軾)이 지은 〈영통사대각국사비명 靈通寺大覺國師碑銘〉에 있는 ‘연참(鉛참)’을 연판 · 연활자판 · 금속활자판의 차례로 임의적인 해석을 하고, 속장본(續藏本)을 고려의 금속활자본으로 본 데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연참은 이익(李瀷)의 《성호사설 星湖僿說》에 “본문을 바로잡아 개판(開板) 또는 판각(板刻)하는 것.”이라 해설되어 있으며, 또 속장본은 본래 목판에 새겨 찍어낸 책이므로 이 설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12세기 중엽의 기원설이다. 성암고서박물관(誠庵古書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진보대전 古文眞寶大全》에 찍힌 소장인의 하나를 ‘이녕보장(李寗寶藏)’으로 보고, 이녕이 1124년(인종 2)에 송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휘종(徽宗)에게 〈예성강도 禮成江圖〉를 바친 인물이었다고 본 데서 비롯한다. 그러나 소장인을 잘못 판독한 것이며, 그 세부적인 설명도 무리한 시도인 것이 확인되었다. 《고문진보대전》은 중국에서 13세기 후반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증편되었고, 우리나라에는 고려말에 들어왔으며 1367년(공민왕 16)이 아니면 1374년에 처음으로 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명에 ‘대전(大全)’이 붙여진 것은 명나라의 사신인 예겸(倪謙)이 1450년(세종 32)에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 책 이후에 간인된 판본부터라는 것도 밝혀졌다. 그리고 이 책은 글자획에 거친 칼자국이 완연하게 보이는가 하면, 인쇄기술이 아주 미숙하다. 그러나 판짜기는 완전한 조립식으로, 둘레의 모퉁이와 계선(界線)이 모두 떨어지고 윗글자와 아랫글자의 사이가 여유있게 떨어져 있으며 매줄의 글자수도 일정하게 19자이다. 이것은 1434년에 주조된 갑인자로 찍어낸 활자본 이후에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따라서 이 책은 조선 전기의 지방목활자본으로 추정되므로 12세기 중엽의 기원설을 뒷받침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고려시대에 금속활자로 책을 찍은 사례는 13세기 전기에 나타나고 있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 南明泉和尙頌證道歌》 중조본(重彫本)의 권말에 붙인 최이(崔怡)의 글에 의하면, “이 책은 선문(禪門)에 있어서 가장 긴요한 책인데, 전하는 것이 별로 없어 얻어보기 어려움에 주자본에 의거하여 1239년(고종 26) 다시 새겨 널리 전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글에 의하여 금속활자인 주자가 1232년 강화로 천도하기 이전인 13세기 초기에 이미 만들어져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며, 또한 그 전본(傳本)이 2벌이나 발견되어 금속활자 인쇄의 실시를 여실히 입증해 준다.고려시대 금속활자의 또다른 기록으로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은 강화로 천도한 뒤 이규보(李奎報)가 진양공(晉陽公) 최이를 대신하여 지은 〈신인상정예문발미 新印詳定禮文跋尾〉이며, 《동국이상국집》 후집에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고려 인종 때 최윤의(崔允儀) 등이 엮은 《상정예문》 50권이 세월이 지나면서 책장이 떨어지고 글자가 결실되자 최충헌(崔忠獻)이 다시 보집하여 2부를 써서 예관(禮官)과 자기 집에 각각 1부씩 간직해두었는데, 그뒤 몽고군이 침입하여 강화로 천도할 때 예관이 미처 가지고 오지 못하여 자기집에 있는 1부만이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자로 28부를 찍어 여러 관서에 나누어 간직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책의 인출연대를 《동사연표 東史年表》에 적힌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부분의 역사책과 연표 등에서 1234년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부탁한 최이가 진양공에 책봉된 해가 1234년이고 대신 지은 이규보는 1241년에 죽었으므로 그 사이에 인출된 것으로 넓게 추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개성의 개인 무덤에서 출토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고려의 금속활자인 ‘복( )’자 1개가 간직되어 있다. 이 활자는 네 변의 길이가 약 1㎝ 정도이나 다소의 차이가 있고 모양도 균정하지 않으며, 뒷면이 둥근 모양으로 옴폭 파여 있다. 글자체는 충렬왕 이후 유행하기 시작한 송설체(松雪體)의 계통이다.
이들 고려 금속활자의 인쇄사실이 세계만방에 의해 공인된 것은 1972년 ‘세계도서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전시회에 프랑스의 파리국립도서관 소장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 공개되면서부터였다. 이 책은 1377년(우왕 3) 흥덕사(興德寺:충청북도 청주에 있던 절)에서 금속활자를 만들어 찍어낸 것이다. 그 인본에 의하면, 활자는 크기와 모양이 고르지 않고 동일한 글자에 같은 모양의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으며, 글자획의 굵기와 가늘기에 차이가 크고 획이 부분적으로 끊긴 것도 적지않다. 그리고 활자의 크기에 차이가 커서 항자수(行字數)에 있어서도 한두 자의 출입이 생겨 옆줄이 맞지 않고 심한 경우는 윗자와 아랫자가 서로 물린 것도 있다. 13세기 전기에 인출된 관주판(官鑄版) 《남명천화상송증도가》 중조본과 비교해보면 그 주조기술이 크게 떨어지고, 조선시대에 주조된 활자에 비하면 더욱 유치하다. 이는 활자를 주조하기 위하여 바탕글자를 쓰고 새겨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근본적으로 달랐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와같이, 고려시대에는 중앙관서에서 금속활자를 만들어 쓰기 시작하였고 그 인쇄술이 지방의 사찰로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와서 금속활자는 세계인쇄문화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크게 발달하였다. 1403년(태종 3) 처음으로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하고 수개월에 걸쳐 금속활자를 주조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계미자이다. 계미자본과 고려 말기의 사주활자본(寺鑄活字本)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을 비교해 보면, 활자의 주조술에 있어서 바탕글자를 쓰고 새겨서 부어내는 과정과 방법이 다르게 개량되어 활자가 비교적 고르고 동일한 글자의 모양이 같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려의 ‘복’ 활자와 비교해볼 때도 활자 뒷면을 뾰족하게 개량하여 밀랍에 잘 꽂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 그 기술이 미숙하여 인쇄능률이 저조하였지만, 이후 금속활자 주조술의 개량과 인쇄술의 발달에 있어서 첫 단계가 되었다. 1420년에 주조된 경자자(庚子字)에 이르러 두번째 단계의 발전을 보게 되었다. 계미자의 모양이 크고 가지런하지 못해 그보다 작으면서도 글자획을 박력 있고 예쁘게 주조한 것이며, 조판용 동판과 활자를 평평하고 바르게 만들어 서로 잘 맞도록 개량하였다. 그리하여 일단 조판해 놓으면 인쇄할 때 밀랍을 사용하지 않아도 활자가 움직이지 않고 매우 해정하여 인쇄능률이 크게 올랐다.조선시대에 세번째로 개량된 활자는 갑인자이다. 앞서 주조한 경자자의 글자체가 가늘고 빽빽하여 조금 크고 해정한 필서체 활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큰 활자와 작은 활자의 크기가 서로 같고 네모가 평정하여, 옆줄이 정연하게 일직선을 이루고 글자 사이도 일정한 공간을 여유있고 늠름하게 유지하고 있다. 조판에 있어서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여 빈 데를 메우는 완전조립식으로 발전시켰다. 먹물도 진하고 잘 묻게 만들어내어, 한결 까맣고 윤이 나서 인쇄가 아름다웠다. 이와같이 금속활자는 그 주조와 조판, 그리고 인출의 기술이 갑인자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다. 또한 특기할 것은 이때 처음으로 한글활자가 주조, 병용된 점이다. 이 한글활자는 근래의 인서체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고딕체의 큰 자와 작은 자로서, 갑인자의 유려하고 부드러운 필서체와 조화있게 배자되어 찍힌 인본을 보면, 그 우아 정교도는 우리나라의 금속활자본 중 백미(白眉)라 할 수 있다.
세종조 이후 조선조 말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류의 활자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명필가의 글자체를 바탕으로 한 활자가 있는가 하면, 중국 각 역조의 간본의 글자체를 바탕으로 한 각종의 필서체 및 인서체의 활자가 있다. 활자를 재료별로 보면, 동활자가 주로 만들어졌고 연활자와 철활자로 주조되었다. 활자를 주조한 주체별로 보면, 주로 관서에서 만들어냈지만, 민간에서 만들어낸 활자도 있었다. 또 활자의 모양은 네모가 평정하던 것이 후기에 와서는 뒷면을 고려 때보다도 더욱 옴폭 들어가게 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활자가 나왔지만 그 기술은 갑인자를 능가하는 것이 없었으므로, 세종조는 활자왕국으로 군림할 수 있는 터전이 구축된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고려 때부터 조선조 말기까지에 나온 각종 금속활자본을 조사, 비교하여보면 그 주조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시대 또는 사찰, 민가 및 관서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조선조의 고도로 발달된 관주활자의 주조방법으로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없다.사찰에서 비교적 근대에 이르기까지 습용해온 금속활자주조의 방법은 활자모양으로 만든 밀랍에 글자를 새기고 녹인 쇳물의 열에 견딜 수 있도록 도가니 만드는 흙과 질그릇 만드는 흙을 잘 섞어 반죽하여 덮어 싸서 자형(字型)을 만들어 구운 다음, 녹인 쇳물을 부어 활자를 조성해내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치졸한 초기의 방법으로서 글자획이 복잡한 자형은 한번밖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글자에 있어서 같은 모양의 것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조선시대에 있어서 후기까지 주로 민간에서 사용해온 활자의 주조방법도 있는데, 이는 《동국후생신록 東國厚生新錄》에 나타나 있다. 질그릇 만드는 흙을 곱게 빻아서 잘 이겨 나무판 위에 다져 까는데, 그 판의 네 가장자리는 모두 둘레를 하였다. 다져 깐 흙이 고루 판판해지면 한낮에 볕에 쪼여 반쯤 말린다. 한편 얇은 닥종이에 크고 작은 글자를 해서(楷書)한 다음, 밀랍을 녹여 칠하여 판 위에 덮어붙이고 각수(刻手)로 하여금 새기게 한다. 다 새기면 쇠를 녹여 그 쇳물을 국자로 떠서 판 위에 부어 흘러들어가게 하고 고루 평평하게 한 다음 식혀 굳히고, 판 위의 것을 들어내리고 하나씩 잘라내어 줄로 갈고 다듬어서 금속활자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완성시킨다. 이와같이, 찰흙에 글자를 새겨 자형으로 하여 활자를 주조하는 경우도 동일한 글자에 있어서 똑같은 모양의 활자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공정이 훨씬 쉽고 비교적 균정된 글자체의 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그 진전된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조선조의 발달된 관주활자의 주조법은 성현(成俔)의 《용재총화 (용齋叢話)》에 의해 알 수 있다. 먼저 바탕글자를 정하고, 인쇄할 책에서 필요한 크고 작은 글자를 파악하여 글씨를 쓰게 하거나, 이미 간행된 책을 자본(字本)으로 삼는 경우는 소요되는 글자를 가려내고 부족한 글자는 비슷한 자양(字樣)으로 보사(補寫)시킨다. 그 다음 바탕글자를 나무판에 붙이고 각수로 하여금 새기게 한다. 나무는 대개 황양목(黃楊木)을 사용하며, 글자를 새기면 하나씩 잘라내어 네 면을 잘 다듬어서 크기와 높이가 일정하도록 정밀하게 손질한다. 이때 나무판은 목장(木匠)이 맡고, 글자 새기는 일은 각자장(刻字匠)이 맡는다. 한편, 주장(鑄匠)은 인판(印板)에 고운 갯벌흙을 평평하게 편 뒤 나무에 새긴 어미자를 하나하나 박고 잘 다져 옴폭 들어간 자형을 만든다. 자형이 다 만들어지면 쇳물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홈길을 만든다. 이어 두개의 인판을 합하고 뚫린 한개의 구멍으로 녹인 쇳물을 쏟아부어 자형으로 흘러들어가게 한다. 쇳물이 굳은 다음 인판을 분리하여 가지쇠를 들어내어 달린 활자를 두들겨 하나씩 떨어지게 하거나 떼어낸다. 떼어낸 활자를 줄로 하나하나 갈고 다듬어서 완성시킨다. 이 방법은 일정한 어미자를 만들어 필요한 만큼 자형을 찍어 활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글자모양이 모두 똑같게 된다. 이는 조선의 관주활자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옛 금속활자는 1883년(고종 20)에 설치된 박문국(博文局)이 일본에서 신식 연활자를 도입한 이후 병용되면서도 서서히 대치되어 한말까지 인서(印書)에 사용되었다. 그 마지막 인본은 1914년에 개최된 조선박람회(朝鮮博覽會)에 전시되었던 임진자본(壬辰字本) 《청구시초 靑丘詩초》가 될 것이다.
갑인자(甲寅字)
1434년(세종 16) 갑인(甲寅)에 만든 동활자(銅活字) 1420년에 만든 경자자(庚子字)의 활자체가 가늘고 빽빽하여 보기가 어려워 좀더 큰 활자가 필요하게 되어 왕명으로 주조된 활자이다. 이천(李천) · 김돈(金墩) · 김빈(金빈) · 장영실(蔣英實) · 이세형(李世衡) · 정척(鄭陟) · 이순지(李純之) 등이 두 달 동안에 20여만의 큰 중자(中字)인 대자(大字)와 소자(小字)를 만든 것이다.
그 자본(字本)은 경연청(經筵廳)에 소장된 《효순사실 孝順事實》 · 《위선음즐 爲善陰즐》 · 《논어》 등으로 하고, 부족한 글자는 뒤에 세조가 된 진양대군 유(晉陽大君 )가 써서 보충하였는데, 활자체가 매우 해정(楷正)하고 부드러운 필서체로서 진(晉)나라의 위부인자체(衛夫人字體)와 비슷하여 일명 ‘위부인자’라 하기도 한다. 이 활자를 만드는 데 관여한 인물들은 당시의 과학자나 또는 정밀한 천문기기를 만들었던 기술자였으므로 활자의 모양이 훨씬 해정하고 바르게 만들어졌다.
경자자와 비교하면 대자와 소자의 크기가 고르고 활자의 네모가 평정(平正)하며, 조판(組版)도 완전한 조립식으로 고안하여 밀랍을 사용하는 대신 죽목(竹木)으로 빈 틈을 메우는 단계로 개량,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하루의 인출량(印出量)이 경자자의 배인 40여장으로 크게 늘어났다. 현재 전하고 있는 갑인자본을 보면 글자획에 필력(筆力)의 약동이 잘 나타나고 글자 사이가 여유있게 떨어지고 있으며, 판면이 커서 늠름하다. 또 먹물이 시커멓고 윤이 나서 한결 선명하고 아름답다. 우리나라 활자본의 백미라 일컬을 만하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활자인쇄술은 세종 때 갑인자에 이르러 고도로 발전하였으며, 이 활자는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여섯번이나 개주(改鑄)되었다. 뒤의 개주와 구별하기 위해 특히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라 일컫고 있다. 이 초주갑인자는 선조초에 재주(再鑄)될 때까지 140여년간에 걸쳐 오래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해지고 있는 인본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대학연의 大學衍義》, 《분류보주이태백시 分類補註李太白詩》 등의 초인본이다. 초주갑인자는 오래 사용하는 사이에 활자가 닳고 이지러지고 부족한 글자가 생겨 1499년(연산군 5) 《성종실록》을 찍어낼 때와 1515년(중종 10)에 보주(補鑄)가 이루어졌고, 그밖에도 수시로 목활자를 만들어 보충하며 선조초까지 사용되었다. 갑인자의 재주에 관하여는 1573년(선조 6) 주조의 계유자설(癸酉字說)과 주조의 경진자설(庚辰字說)이 제기되어 분분하였다. 그러던 중 근래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서 뒤의 경자자설이 옳음이 밝혀졌다. 선조 때의 고관인 김귀영(金貴榮)의 문집인 《동원집 東園集》에 의하면 1580년에 대내에 소장한 갑인자본 《대학연의》를 자본으로 9개월 걸려 주성하였으며, 그 일은 박순(朴淳) 등이 감독하고 황윤길(黃允吉) 등이 관장하였다. 재주갑인자는 초주갑인자에 비하면 정교도가 떨어지고 운필에 박력이 적지만, 이후의 다른 개주갑인자보다는 낫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재주갑인자의 인본으로는 《회찬송악악무목왕정충록 會纂宋岳鄂武穆王精忠錄》 · 《시전대전 詩傳大全》 등을 들 수 있다. 갑인자의 세번째 개주는 1617년(광해군 9)에 임진왜란으로 중단되었던 종래의 주자제도를 복구하고자 주자도감(鑄字都監)을 설치하고 주조를 시작하여 다음해인 1618년 7월에 완성되었다. 그해의 간지를 따서 무오자(戊午字) 또는 광해군동자(光海君銅字)라 한다. 갑인자를 개주한 것 중에서는 가장 박력이 없으나, 갑인자의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활자의 특징은 1623년(인조 1) 6월에 사간 정온(鄭蘊)에게 내사(內賜)한 기록이 적힌 유시부(柳時溥) 소장 《서전대전 書傳大全》이 발견됨으로써 밝혀진 것이다. 이 활자로 찍어낸 책은 그밖에 《시전대전 詩傳大全》만이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임진왜란 후의 어려운 사정 속에 이루어진 개주였기 때문에 그 규모가 작았고, 또 광해군 말기의 실정으로 책의 인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624년 이괄의 난으로 흩어져 없어진 데 기인할지도 모른다. 갑인자의 네번째 개주는 호조판서와 병조판서의 자리에 있으면서 수어사(守禦使)를 겸직한 바 있던 김좌명(金佐明)이 1668년(현종 9)에 호조와 병조의 물자 및 인력을 사용하여 수어청에서 대자 6만6100여개와 소자 4만6000여개의 동활자를 주조한 것으로, 이 활자들은 그가 죽은 뒤 교서관(校書館)으로 옮겨졌다.
이것을 그해의 간지를 붙여 무신자(戊申字) 또는 무신갑인자라 한다. 이 활자도 개주갑인자로서는 정교롭지 못하나 무오자보다는 박력이 있으며, 영조 말기까지 백여년 동안 사용되어 그 인본의 종수가 매우 많다. 이와같이, 오래 사용되었기 때문에 초기에 찍은 책은 인쇄가 깨끗하지만, 뒤에 찍은 것은 활자가 닳고 이지러지고 목활자가 많이 섞여 인쇄가 정교하지 않은 편이다. 사주갑인자본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잠곡선생연보 潛谷先生年譜》와 《잠곡선생유고 潛谷先生遺稿》를 들 수 있다.
갑인자의 다섯번째 개주는 정조가 동궁으로 있던 1772년(영조 48)에 갑인자본 《심경 心經》과 《만병회춘 萬病回春》을 자본으로 하여 주조한 것으로 임진자(壬辰字)라 하며 교서관에 두고 사용하였다. 정조의 관찬서를 해제하여 연대순으로 엮어놓은 《군서표기 群書標記》에서 수록된 그 인본을 보면, 1772년에 《역학계몽집전 易學啓蒙集箋》, 1773년에 《신정자치통감강목속편 新定資治通鑑綱目續編》, 1775년에 《경서정문 經書正文》, 1777년에 《원속명의록 原續明義錄》, 1799년에 《아송 雅誦》 등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고려대학교 박물관에는 임진자 조판의 실물이 있다. 마지막으로 나온 갑인자계 동활자는 1777년에 평안감사 서명응(徐命膺)에게 명하여 15만자를 더 주성케 하였으며 정유자(丁酉字)라 일컫는다. 정유자는 가주(加鑄)한 것으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나, 교서관에 둔 임진자에 합치지 않고 규장각의 본원에 따로 두고 사용하였다.
그러나 글자체가 서로 같아 인본의 식별이 어려워서 종래는 정유자가 주성된 1777년 이전의 책만을 임진자본으로 보아왔다. 《군서표기》에 의하면, 1781년(정조 5)에 정유자로 찍어낸 《팔자백선 八子百選》이 초기 인본이며, 그 이후 계속해서 나타난다. 이 활자는 1794년에 이르러 창경궁의 옛 홍문관에 설치한 주자소로 옮겨졌는데,1857년(철종 8) 8월 주자소에 불이 나서 활자가 모두 소실되었다. 그때 화재로 소실된 다른 활자는 다음해에 다시 주성되었지만 정유자만은 주조되지 않았다. 그것은 교서관에 둔 임진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정유자는 1857년까지 인쇄에 사용되고, 그 이후는 임진자가 조선 말기까지 사용되다가 다른 활자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어 그 잔존 활자가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 <갑인자를 만들던 주자소터 표석 사진> -현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60-1 중부세무서 앞 극동빌딩 자리 (2003. 8. 17. 안사연 현지 답사. 발용(군)촬영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