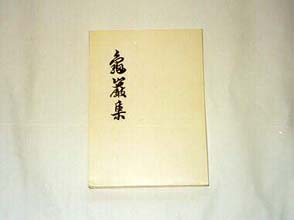본문
|
|
|
1515(중종10)∼1575(선조8) 字는 恕初, 號는 龜岩·悟竹山人, 1545年(明宗 1) 別試文科에 급제하여 持坪, 獻納, 北平事를 거쳤다. 乙巳士禍 때는 서울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削職되고, 서청주(현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에 유배되었다가 宣祖初에 放還되었다. 그 후 安岳郡守가 되었으며 妖僧普雨를 벌할 것을 누차 上疏한 바 있다. 후에 輔祚功臣 左贊成 上洛君에 추증되었다. 墓는 충북 중원군 살미면 무릉동에서 충북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로 遷封하였다. 2006. 4. 5. 다시 능촌리 개향산으로 2차 천봉하였다. 문집으로 <龜巖集>(구암집)이 전한다.
<구암공 묘소-2006. 4. 5. 개향산 이장 묘소> (좌-영상공, 중-구암공, 우-현감공(휘 효갑))
<신도비>(신도비의 우측 묘소) <구 묘비>
<개향산 이장 전의 충민사 뒤의 묘소>(충북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2002. 9. 20. 항용 촬영.)
<구암바위>(충남 천원군 병천면 가전리. 공이 사시던 곳에 있음) <구암집>(1812년(순조12) 목활자본 초간본 발간. 1983 년 후손 김상형 증보판 발간).
<친필 서찰 및 시문>(2002. 9. 20. 발견. 항용(제) 제공) 1. 발견일 : 2002. 9. 20. 2. 발견장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金奎文 종친 댁 3. 발견 문헌 원전 : 묵휴창수(묵(口+黑)休唱酬) 1) 默齋 李文楗공의 시문집. 충북 지방문화재 162호 2) 제작 연대 : 1555년으로 추정. 묵재공이 성주에 유배가 있을 때, 회갑되는 해(1555년)에 재호(齋號)를 읊어 세상에 심회를 펴 내 놓으니 퇴계, 율곡, 남명, 청송 등 당대의 문사들의 화답시가 몰려 들자 이를 공께서 손수 편집하여 책자로 만든 것. 3) 번역 해제문 출전 : <묵휴창수>(楷書國譯. 1982년 묵재 15대손 李昌燮 역) 4. 원문 소장처 : 충북 괴산군 문광면 전법리 묵재 이문건(李文楗)의 종손댁 5. 원문 시문집 작성자 : 默齋(묵재) 李文楗(이문건) * 이문건(李文楗) : 1494(성종 25)∼1567(명종 2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자발(子發), 호는 묵재(默齋)·휴수(休酬). 승문원 정자 윤탁(允濯)의 아들이다. 충북 괴산군 문광면에서 출생. 일찍이 중형 충건(忠楗)과 더불어 조광조(趙光祖)의 문하에서 학업을 닦고, 1513년(중종 8) 중형과 함께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1519년 기묘사화로 조광조가 화를 입자, 그 문인들이 화를 염려하여 감히 조상하는 자가 없었으나, 그의 형제는 상례(喪禮)를 다하였다. 이에 남곤(南袞)·심정(沈貞)의 미움을 받아 1521년 안처겸(安處謙)의 옥사에 연루되어 충건은 청파역(靑坡驛)에 정배되었다가 사사되고, 그는 낙안(樂安)에 유배되었다.
1527년 사면되어 이듬해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정원 주서에 발탁되었고, 이어서 승문원박사를 거쳐 정언·이조좌랑에 이르렀는데, 이때에 전날의 혐의로 대간으로부터 서경(署經)이 거부되었으나, 김안로(金安老)의 협조로 관로는 순탄하였다. 1539년 장령을 역임하며 관기확립에 힘썼고, 그뒤 통례원우통례(通禮院右通禮)를 거쳐 승문원 판교가 되어, 중종의 국상을 맞아 빈전도감(殯殿都監) 낭관으로서 대사를 무난히 처리하였다. 1546년 명종이 즉위하면서 윤원형(尹元衡) 등에 의하여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족친 이휘(李輝)가 화를 입었고, 이에 연루되어 성주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몰하였다. 성품이 근후하였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23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경사(經史)에 탐닉하고 시문에 힘쓰니, 뒤에 이황(李滉)·조식(曺植)·성수침(成守琛)·이이(李珥) 등이 그의 시문을 즐겨 읊었다. 괴산의 화암서원(花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이 분은 영상공 휘 錫(구암공의 부친)의 매부로 구암공 및 그의 아우(효갑, 우갑, 제갑, 인갑)들을 가르치기도 함.
6. 한문 원문 및 번역문 姪素有易言之病. 自遭禍以來. 常自痛責, 每以煩易爲戒. 然而對人談話. 多有追悔之事. 今因遠離賜詩. 以戒中姪深病. 奚啼百金之賜. 可爲平生楷範銘佩于身. 玆依韻. 綴拾荒拙仰達鄙悰
조카인 제가 본래 말을 쉽게 하는 병이 있어 사화(을사사화)때 화를 당한 뒤에 항상 뼈저리게 느낀 바 있어 언제나 조심하였나이다. 그러나 사람을 대하여 말을 하고 나면 뒤에 후회하는 일이 많았사옵니다. 지금 먼 곳에서 글을 보내 주셔서 조카의 깊은 병을 맞추어 경계하시니 백량의 황금을 주시는 것보다 중한 일이오니 가히 평생을 두고 몸에 새겨 지키겠나이다. 이에 운자에 따라 조촐한 글귀를 올리나이다.
患禍皆從言語萌 걱정거리와 재앙은 모두 말 잘못함으로 생기나니 要將愼묵(口+黑)遠人評 요컨대 잠자코 삼가서 사람을 비평하는 것을 멀리해야 한다. 溫和己覺添淸福 온화한 태도는 자기에게 맑은 복을 더하고 煩易還知損性靈 번잡스러운 것은 도리어 성령(性靈)을 해롭게 한다. 世路豈宜容懶質 세상살이에 어찌 게으른 것을 용서하겠는가? 林泉端合送微生 임천(林泉-자연)은 끝내 내가 살기에 알맞기만 하구나. 戒詩三復多深省 경계하신 글을 두 세 번 읽어 나의 행실을 깊이 살피고 夙夜銘心敢自輕 밤이나 낮이나 마음속에 새겨서 중요하게 여기겠나이다.
己酉(1549. 서청주 유배시, 작자 35세) 二月 姪 忠甲 奉稿
|